5월의 교정은 대자보의 물결이다. 젊음을 증거하는 그 격한 말들 속에 유난히 눈에 밟히는 붉은 글씨가 있었다. "역사는 기억과의 싸움이다. "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의 진실을 캐묻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TV가 맛있는 것, 멋있는 것만 보여주는 건 직무유기다. 불과 21년 전 광주에 대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는가. 속옷차림으로 계엄군에 질질 끌려가던 청년의 모습조차 이제는 박물관의 사진처럼 낯설지 않게 돼 버렸다.
'낮에도 별은 뜬다' (기획 최창욱.연출 임화민) 는 드라마로서의 완성도를 떠나 광주의 상처를 외과적으로뿐 아니라 내과 혹은 신경정신과적으로 해부했다는 점에서 '문제작' 이다. '서울의 달' '도둑의 딸' 등 사회성 짙은 드라마를 생산한 작가 김운경이 보여주고 싶었던 '해에 가려진 별' 의 원형은 무엇일까.
이야기는 1980년 5월 17일 밀린 술값을 받기 위해 광주에 내려갔다가 채무자로부터 술대접 받고 결국엔 여종업원(양미.김여진) 과 여관에까지 자연스럽게 직행한 세속의 청년(갑수.감우성) 으로부터 시작한다.
그에게 시대에 대한 고뇌 혹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은 물론 없다. '데모하는 놈들 사람같이 안 보던' 그는 계엄사에 붙들려와서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지낸 이모부에게 청탁전화를 넣는 정도의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었다.
문제의 시작은 그들이 머문 여관방에 시위대의 한 청년이 몸을 숨겨달라며 뛰어든 것이다. 그에게 비로소 '시대' 가 말을 건 것이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계엄군이 들이닥치고 정말 '본의 아니게' 그는 '양심 있는 시민' 이 되고 만다. 점입가경.
양미의 남동생이 주검으로 발견되고 리어카에 시신을 싣고 가는 갑수의 사진이 외신에 실리면서 그는 드디어 간첩으로 '찍혀' 감옥에 갇히게 된다.
'나름대로의 안보철학이 있고 국가관이 있는' 고문기술자(강상사.명계남) 는 갑수에게 말한다.
"본의 아니게 너한테 아엠쏘리 했다면 넌 댓츠 오케이 하고 여기서 나가면 끝나는 거야. "
이 드라마는 강상사뿐 아니라 TV 역시 부당한 권력 앞에서 일개 주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민망한 수위까지 들쳐 보여준다.
광주에 피와 함성이 솟구치는데 TV는 당시 인기 있던 가수들이 돌아가며 노래부르는 모습을 태연스레 보여준다. 불의에 맞장구치며 춤추던 TV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해와 용서보다는 함무라비의 권고(눈에는 눈, 이에는 이) 를 수용한 주인공이 마지막 내뱉는 절규(아엠 쏘리) 가 여운으로 남는다. 역사는 그에게 '댓츠 오케이' 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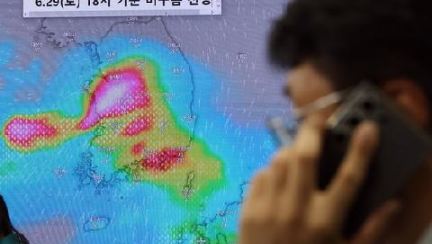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