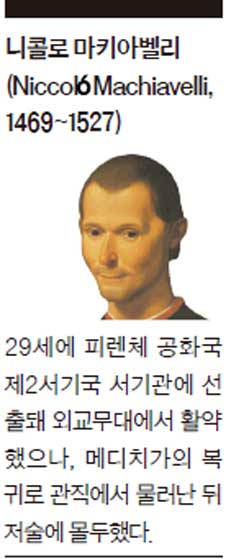
실직한 마흔네 살의 전직 관료, 시골집에 은둔한 지 8개월째, 딸린 식구는 아내와 어린아이 넷, 모아둔 돈도 없이 나무 벌채로 근근이 먹고산다. 저녁 무렵이면 선술집에 들러 자신을 향한 운명의 장난에 분노를 터뜨리지만, 밤이 되면 관복으로 갈아입고 서재에 들어간다.“예절을 갖춘 복장으로 몸을 정제한 다음, 옛사람들이 있는 옛 궁정에 입궐하지. 그곳에서 나는 그들의 친절한 영접을 받고 나만을 위한 음식을 먹는다네. 나는 부끄럼 없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곤 하지. 그렇게 보내는 네 시간 동안 나는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아. 모든 고뇌를 잊고, 가난도 두렵지 않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끼지 않는다네.”
박정태의 고전 속 불멸의 문장과 작가 <15>『군주론』과 니콜로 마키아벨리
1513년 12월 10일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으로 『군주론(The Prince)』을 쓰고 있다고 소개한다. “나는 그들과의 대화를 소논문으로 정리해 보기로 했네. 군주국이란 무엇인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획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보전할 수 있는가? 왜 상실하는가?”
그가 『군주론』을 쓴 목적은 단 하나, 복직을 위해서였다. 『군주론』은 그래서 당시 피렌체 공화국의 실권자였던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바치는 헌정사로 시작된다. 군주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의 소유물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데, 그는 “꾸준한 독서를 통해 습득한 위대한 인간들의 행적에 관한 지식만큼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적는다.
마키아벨리가 정리한 내용은 모두 26장, 구구절절 명쾌하면서도 냉정하기 이를 데 없고,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 깔려 있다. 이런 식이다. “인간들이란 다정하게 안아주거나 아니면 아주 짓밟아 뭉개버려야 한다. 인간이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하려 들지만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감히 복수할 엄두도 못 내기 때문이다.”
『군주론』 이전까지 정치는 감미로운 이상이었다.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도덕론이 지배한 세계였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고려할 때” 혹은 “경험에 비춰보면”이라는 전제 아래 현실론을 들이민다. 갑자기 정치가 냉혹한 현실이 된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는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바를 행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를 고집하는 군주는 권력을 잃기 십상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선하게 행동하려는 사람이 무자비한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의 몰락은 불가피하다.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군주는 필요하다면 부도덕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그래서 군주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한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받는 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덜 주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주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자의 무력과 여우의 지혜를 제시한다.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를 물리칠 수 없다. 함정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사자의 힘에만 의지하는 자는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는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며 지켜서도 안 된다.”
너무 삭막한가. 그렇다면 위대한 선인(先人)들을 모방하라는 대목을 보자. 마치 동양 고전의 한 구절을 읽는 느낌이다. “노련한 궁사가 목표물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활을 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행동해야 한다. 그는 자기 활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곳을 겨냥하게 되는데, 이는 그 높은 지점을 맞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맞히기 위해 일부러 그곳을 겨냥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로렌초 데 메디치는 『군주론』을 아예 읽어보지도 않는다. 다시 한번 운명의 여신에게 버림받은 그는 끝내 관직에 복귀하지 못한다. 『군주론』은 그의 사후 5년 만에 출간되지만, 1559년 교황청은 선량한 그리스도교도에게 적당치 않다며 마키아벨리의 모든 저작을 금서로 지정한다.
그의 이름을 딴 마키아벨리즘은 한동안 사악한 권모술수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지금 마키아벨리는 근대 정치사상을 처음으로 주창한 인물로 화려하게 복권됐다. 요즘 들어서는 기업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데, “결과만 좋으면 수단은 언제나 정당화된다”는 문장에서 읽을 수 있듯 무엇보다 효율을 우선하는 그의 철학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마키아벨리는 개인이나 기업의 사익을 위해 책을 쓴 게 아니다. 그가 “필요할 경우 주저 없이 악을 택하라”고 말할 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조국의 이익이었다. 『군주론』의 마지막 장은 “야만족의 지배로부터 이탈리아의 해방을 위한 권고”다.
박정태씨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경제신문, 한국일보 기자를 지냈다. 굿모닝북스 대표이며 북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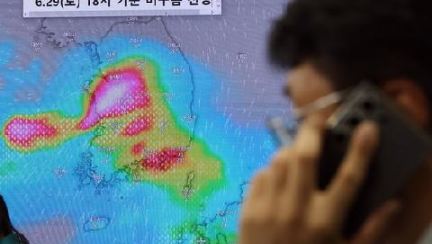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