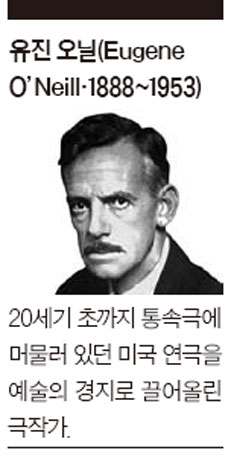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 대박 한번 터뜨릴 거라고.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인생 역전에 팔자 뒤집어질 거라고. 예전엔 나도 슬며시 거들어주었다. 누구나 우산도 없이 폭풍우 속을 걸어갈 때 온몸이 어쩔 수 없이 젖어버리듯 그렇게 돈벼락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든다. 아직 돈벼락을 못 맞았다고? 그거 더 잘 된 거야. 돈이란 말이지, 행운의 탈을 쓴 불행이거든. 그러고는 『밤으로의 긴 여로(Long Day’s Journey into Night)』에 나오는 대사 한 줄을 덧붙일 것이다.
박정태의 고전 속 불멸의 문장과 작가 <11>『밤으로의 긴 여로』와 유진 오닐
“거저 얻다시피 한 그 빌어먹을 작품이 흥행에 엄청나게 성공하는 바람에, 그걸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내 손으로 무덤을 파고 말았지. 다른 작품은 하고 싶지도 않았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놈의 것의 노예가 된 걸 깨달은 뒤 다른 작품들을 시도해 봤지만 너무 늦었지. 그 배역의 이미지가 너무 굳어져서 다른 역할이 먹히질 않는 거야. 몇 년 동안 편하게 한 역만 하면서 다른 역은 해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 했으니 예전의 그 뛰어난 재능을 다 잃어버린 거지.”
제임스 티론, 연극배우로 제법 성공했고 돈도 꽤 모았지만 가족으로부터는 지독한 노랭이 영감 소리를 듣는 그가 운명을 향해 이렇게 항변한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밤으로의 긴 여로』는 1912년 8월의 어느 아침부터 그날 자정까지 티론과 아내 메리, 두 아들 제이미와 에드먼드가 지나간 과거를 하나씩 풀어놓는 4막 5장의 희곡이다.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 출신으로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 마약 중독자로 과거의 환상에 매달리는 어머니, 술과 여자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형, 폐병 환자로 자살까지 기도했던 시인 동생,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탓하며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증오하고 잠깐 이해하지만 끝내 화해하지는 못한다. 메리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운명을 거역할 수 없어. 운명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손을 써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하게 만들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진정한 자신을 잃고 마는 거야.”
유진 오닐이 아내에게 바친 헌사에서 “내 묵은 슬픔을 눈물로, 피로 쓴” 극이라고 밝혔듯이 이 작품 속에는 그의 절절한 심정이 배어 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사후 25년 동안은 발표하지 말고 그 이후에도 절대 무대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했을까. 그만큼 이 작품은 그의 가슴 아픈 가족사를 그대로 담아냈다.
티론처럼 그의 아버지 제임스 오닐은 학교도 못 다니고 공장 일을 하면서 독학으로 연기 공부를 한 끝에 그토록 꿈꾸었던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연극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주인공 역을 맡아 부와 명성을 거머쥐면서 흥행 배우로 주저앉는다. 한 시즌에 당시로서는 거금인 4만 달러를 벌었으니 도저히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25년간 미국 전역을 돌며 6000회 이상의 순회공연을 한다.
“행운의 탈을 쓴 불행이 엄청난 돈벌이 기회를 가져다 준 거야. 처음엔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운명의 장난이 시작됐던 거지. 도대체 그 돈으로 뭘 사고 싶어서 그랬는지. 하기야,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겠어. 후회해도 때는 늦었지. 훌륭한 배우로 성공했더라면, 그래서 그 추억에 젖어 살 수만 있다면 땅 한 뙈기 없어도 좋고 은행에 저금 한 푼 없어도 좋아. 그래, 어쩌면 인생의 교훈이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돈의 가치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바람에 결국 배우 인생을 망치게 된 건지도 모르지.”
티론은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 셰익스피어 극의 주인공 역을 번갈아 맡아 무대에 섰을 때가 배우 인생의 정점이었다고 회고한다. “원하는 곳에 서 있었으니까!”
오닐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퓰리처상은 사후에 이 작품으로 받은 것까지 네 번이나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달팠다. 말년에는 소뇌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마비 증세와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내와의 불화, 장남의 자살, 딸과의 의절이 이어졌다. 보스턴의 한 호텔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그의 마지막 말은 “빌어먹을, 호텔 방에서 태어나 호텔 방에서 죽는군!”이었다.
작품 속에서 오닐의 분신이기도 한 에드먼드는 자기 인생에서의 정점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만물의 베일을 벗기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한순간 우리는 만물의 신비를 보고, 그러면서 자신도 신비가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그 손이 도로 베일을 덮으면 다시 혼자 안갯속에서 길을 잃고 목적지도, 그럴듯한 이유도 없이 비틀거리며 헤매는 거죠!”
그렇다. 인생의 정점은 순간이다. 잠시 신비를 보는 것이다. 그러고는 다시 안갯속을 헤매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박정태씨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경제신문, 한국일보 기자를 지냈다. 출판사 굿모닝북스 대표이며 북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



![[단독] NASA 출신 새 기상청장 "100년만의 폭우, 이젠 30년에 한번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1/9f34ae5b-1267-4749-98b8-fce61d535466.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