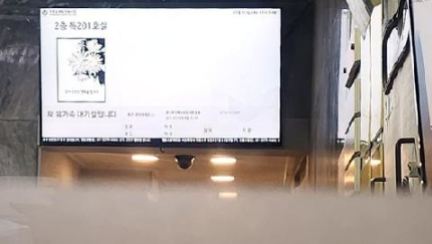국내 유명 한의대에 다니는 박진철(가명·23)씨는 “지난해 2학기 수강했던 전공과목 교수만 생각하면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강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는데도 여전히 강단에 서는 교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교수는 연봉 7300여만원을 받는 정년 보장 교수(직급 부교수)였다.
대다수 학생들이 강의에 불만을 터뜨려도 일단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등록금이 물가 수준의 3배가량 오르고 교수 연봉도 계속 높아졌으나 정작 학생들이 교수들의 강의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낮다. 고액 등록금이 문제가 되는 배경엔 교수들의 교육의 질도 한몫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강의를 녹화해 봤더니 교수들은 대개 ‘내용이 이해됩니까? 혹시 질문 있어요?’ 정도의 단편적인 질문 몇 개를 던지고 말더라”며 “수업 내내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학생들은 받아 적는 게 고작”이라고 말했다.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간 소통은 거의 단절돼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전국 대학생 2019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수강신청을 할 때 교수와 거의 의논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9%에 달했다. 진로에 대해서도 교수와 거의 의논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41.3%였다.
교수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이나 승진심사에서 연구 실적 비중이 커 학생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최미숙 대표는 “대다수 교수들이 강의와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일부 교수가 대외활동을 너무 많이 하느라 학생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등록금이 오르면 교육여건이라도 개선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반대를 기준으로 2000년 32.2명이던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 수는 2010년에 36.2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 숫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배가 넘는다. OECD는 우리나라를 등록금이 비싸고 학생 지원 제도가 부실한 국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별취재팀=강홍준(팀장)·김성탁·박수련·윤석만·강신후·김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