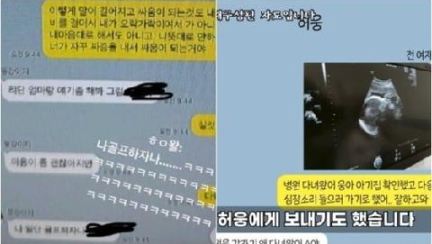임미진
경제부문 기자
일류 국가를 향하여.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며 정부가 내건 구호다. FTA로 시장을 열면 한국이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것이라는 얘기였다. 외교통상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신문 기고에서 “미국과 FTA 협상을 시작한 것 자체가 한국이 선진국이 된 이정표”라며 감격스러워했다.
일류를 향한 노력은 치열했다. 지난 8년간 한국은 45개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 이른바 ‘동시다발적 FTA’의 성과다. 13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은 미국·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은 세계적 FTA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겉만 일류면 뭐 하나, 시스템은 삼류였다. 속속 불거지는 FTA 협정문 한글본의 오역 논란에서 드러난다. 1200여 쪽짜리 한·EU FTA 협정문에서만 207곳의 오역이 나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국회에서 “한·미 FTA 협정문에서도 오역이 나오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 때문에 여야 몸싸움 속에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이 철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삼류 시스템의 현실은 이렇다. 동시에 4개의 협상을 진행하는 외교통상부 직원들이 수천 쪽의 협정문 번역에도 매달렸다. 예산을 아끼려고 무급 인턴에게 협정문 검독을 맡겼다. EU는 공식 문서에 대한 검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는 검독 전담 공무원조차 없다. 영어 교육자 조화유씨는 최근 본지 기고에서 “정부 문서에 엉터리 영어가 너무 많아 문화체육관광부에 영어 감수팀을 만들라고 권고했지만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오역에 대해 사과하면서 “과연 완벽한 번역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일류와 삼류를 가르는 기준은 양적 성장이 아니다. 이창용 전 G20 기획조정단장은 언젠가 선진국의 힘은 디테일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빌딩이 아무리 높아도 창틀 디자인이나 외벽 마감이 엉성하다면 선진국 빌딩이 아니다. 오역 파문이 진정한 일류가 되기 위한 성장통(成長痛)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미진 경제부문 기자
![[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