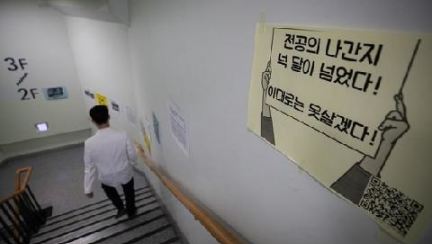경남 김해시 주촌면 돼지농가에 이어 25일 인근 돼지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농가 경계지역(3~11km) 내에 위치한 김해축산물 공판장도 이틀간 폐쇄됐다. 경매가 중단된 김해축산물공판장이 썰렁하다. [연합뉴스]
“매뉴얼에 따라 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담당자들이 되뇌던 말이다.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표준행동요령(매뉴얼) 대로 했다. 구제역은 쉽게 종식됐다. 이때부터 축산 담당 공무원들은 매뉴얼을 신주단지 모시듯 했다.
하지만 신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였다. 매뉴얼은 2000년과 2002년 국내 발생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대상이 국지적이고 소규모다. 그렇다보니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잠복기부터 문제가 됐다.
바이러스가 가축에게 전염된 뒤 항체 형성까지 최대 2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이 매뉴얼대로면 아예 방역 사각 시기가 된다. 이때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간이 진단도구로는 알아낼 방법이 없다. 안동에서 경기도로 이미 바이러스가 건너간 지 한참이 지나서야 공식 발생이 확인된 이유다. 방역 당국은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했다. 하지만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없었다.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500m 이내 살처분과 3~10㎞까지 이동제한 매뉴얼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했던 셈이다.
주먹구구식 역학조사도 전국 확산을 부추겼다. 매뉴얼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그에 따른 살처분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나 차량 출입 기록도 없이 기억에만 의존해 감염경로를 추적하다 보니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다.
백신접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매뉴얼에는 백신접종과 대상은 가축방역협의회 자문에 따른다고 돼 있다.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자의적 판단이 개입하기 쉽다. 실제 경기도 전염이 확인된 시점에 과감하게 백신접종을 결정했다면 전국 확산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이 경기 북부에서 강원도로 퍼질 때까지 백신 접종을 주저했다. 강원을 거쳐 경기 남부와 충북으로 확산될 때 까지도 ‘5개 시군 소→일부 시군 확대→전국 확대→돼지도 추가’ 하는 식으로 찔끔찔끔 확대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에야 전국적으로 백신을 확대했다.
최현철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2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