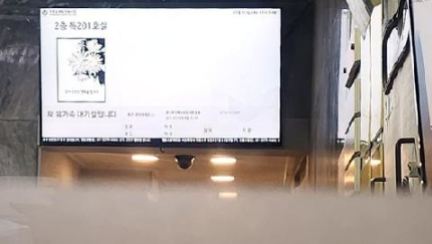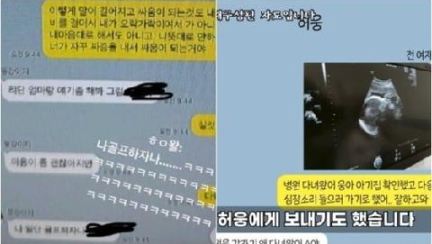얼마 전에 나는 철수씨를 만났다. 철수씨는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식당에서 함께 일한 동료다. 동료라고 해도 그는 주방장이고 나는 식당일 경험이라고는 단골로 가던 식당에서 할머니가 바쁠 때 도와 드린다고 테이블 한번 치워본 게 전부인 초보 웨이터였다.
김상득의 인생은 즐거워
식당에서 일해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주방과 홀은 좋은 의미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다. 가령, 홀에서 일하는 사람이 손님에게 받은 주문을 잘못 넣으면 주방은 난리가 난다. 또 주방에서 낸 음식에 문제가 있어 손님으로부터 항의를 받는다든지 하면 홀은 주방을 비난한다. 홀이고 주방이고 그런 실수는 대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을 때 일어나는데 초보가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초보 웨이터는 주방의 밥이다. 실수를 기다렸다가 그 기회에 홀 전체를 싸잡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주방장 철수씨는 내 실수에 너그러웠다. 주방이나 홀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야단칠 때도 나서서 감싸 주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홀에서 일 잘하는 방법에 대해 이것저것 친절하게 조언도 해 주었다.
철수씨는 일본에서만 두 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다. 이번에 한국에도 자신의 식당을 내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한다. 사장이 되면 외모도 변하는지 그는 소년 같은 얼굴은 사라지고, 배도 살짝 나왔다.
우리는 철수씨가 묵고 있는 호텔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술도 마시면서 함께 일했던 시절의 일들을 추억했다. 철수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가 모르는,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는 추억 하나가 떠올랐다.
철수씨는 무슨 일이든 잘했다. 손도 빠르고 요리 솜씨도 좋았다. 노래는 또 어찌나 구성지게 부르는지 그가 이문세의 노래라도 몇 곡 부를 때면 다들 눈물을 흘렸다. 철수씨는 나처럼 술을 좋아했다. 우리는 한집에서 살았는데 날씨가 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철수씨는 꼭 내 방문을 두드렸다. 술 마시자면서. 캔맥주나 일본 술을 함께 마시다가 취하면 그는 슬그머니 내 침대 속으로 들어가서 눕곤 했다. 매번 나는 그를 깨워 자신의 방으로 돌려보내곤 했지만, 하루는 웅크리고 잠든 철수씨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냥 두었다.
늘 혼자 자다가 옆에 사람이 누워 있으니 불편했다. 그래도 어떻게 겨우 잠이 들려던 나는 내 몸에 다른 사람의 손이 와 닿는 것에 놀라 깼다. 이건 뭐지? 알 수 없었다. 그것이 참 애매한 것이 그저 잠결인 것도 같고 욕망이 담긴 손길인 것도 같았다. 나는 돌아눕는 척하며 살짝 몸을 뺐다. 그런데 잠결에 철수씨의 우연한 손길은 집요해서 다시 손이 내게로 넘어왔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의 잠결은 참으로 느리고 부드럽고 고요한 그러면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손길이었다. 그것은 제안이었을까.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둡고 뜨거운 것이라서 나는 몸을 빼서 화장실로 갔다. 마렵지도 않은 오줌을 누고 방으로 돌아오니 그는 다시 웅크리고 순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때 정말 잠결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내 상상이 지레 오해한 것 같아 나는 철수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 내 마음이 그에게도 전해진 것일까. 친절한 철수씨가 이렇게 말한다.
“상득씨, 이러지 말고 내 방에 가서 한잔 더 해요.”
부부의 일상을 소재로 『대한민국 유부남헌장』과 『남편생태보고서』책을 썼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스스로 우유부단하고 뒤끝 있는 성격이라 평한다. 웃음도 눈물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