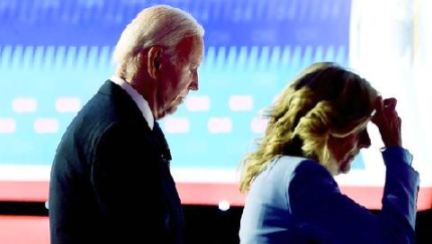문화재연구실이 신설되면서 초대실장으로 부임한 김정기(金正基)씨는 경주 불국사 발굴·복원 현장에 매여 있었다. 나는 목조건물인 경복궁 자경전(慈慶殿) 자료실에서 근무했고 그해 겨울을 나면서 여러 가지 간직할 만한 추억들을 가지게 됐다.
모두들 박봉에 시달리던 시절이라 점심은 주로 라면으로 때웠다. 요즘 라면은 종류도 가지가지지만 당시는 오로지 삼양라면뿐이었다. 겨울철 난방시설은 조개탄을 때는 무쇠로 만든 난로였는데 벌겋게 달아오른 난로에 냄비를 얹어 라면을 끓였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무지한 행동이었다. 혹시 불이라도 났으면 어땠겠는가. 소중한 문화유산을 태워버리지 않았겠는가. 거기다 라면을 박스로 사두다 보니 쥐가 갉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목조 문화재 안에서의 음식 조리는 라면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과가 끝나면 단골 음식점에서 무쇠 불고기판을 빌려 난로 위에 올려 놓고 동료들과 둘러앉아 푸줏간에서 사온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우며 소주 한잔 걸치는 일이 잦았다. 지금도 그 시절, 그 맛을 돌이켜보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인다. 하지만 역시 정신나간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궁궐 내 목조건물에서 그런 일을 벌인 것 아닌가.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만감이 교차한다.
김정기 실장은 국립박물관 고고과장 신분으로 불국사 복원을 위한 현지 조사위원으로 위촉돼 주로 발굴 현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자신이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실장에 임명된 전후 사정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김재원 국립박물관장으로부터 불호령이 내렸다.
'자신과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자리를 옮겼다'며 노발대발한 것이다. 심지어 '김정기가 나를 배신했다'는 극언까지 했다고 한다.
김실장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 김재원 관장이 노발대발한 이유는 어찌보면 김정기 실장을 키운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김재원 관장은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발굴현장에 일하던 김정기씨를 1959년 스카우트해서 국립박물관 고고과장으로 발탁했다. 은사나 다름없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문화재연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국립박물관을 떠나기 위해 로비한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다.
전회에서 밝혔듯 복원을 전제로 한 불국사 발굴조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 발굴 환경은 지금 돌이켜보면 원시적이었다. 불국사는 당시에도 관광객들로 붐볐고 자연히 발굴현장 종사자들의 신경은 날카로웠다. 요즘같으면 차단막을 설치해 관람객들의 출입을 막았겠지만 당시 여건은 그런 용도의 예산을 마련할 형편이 못됐다. 기껏 새끼줄로 발굴현장을 둘러쳐 사람들을 작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정도였다.
당연히 완벽한 출입통제는 기대할 수 없었다. 간혹 불쑥 발굴 현장 안에 들어와 애써 정리해 노출해 놓은 유구(遺構)를 밟아버리는 황당한 관광객도 있었다. 발굴 조사 과정에서 유물이 출토된 경우에는 출토 상태를 촬영한 후 위치와 간단한 특징만을 기록하고는, 유물을 수습해 안전한 실내로 옮기지 않고 출토 상태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출토되는 유물과의 동반관계를 알기 위해서다.
한번은 술취한 관광객이 발굴조사장 안에 들어와 미처 수습하지 못한 출토 유물을 들고는 '이런 곳에서 무슨 수작들이냐'며 시비를 건 경우도 있었다. 취객이 기와편을 들었기 망정이지 유리제품이나 약한 재질의 유물을 들었다면 끔찍할 뻔했다. 자칫 깨어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고고학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에 식은 땀이 흐르는 일이다. 밤에는 현장 경비를 철저히 세워둬야 했다. 밤사이 도굴될 가능성이 상존했기 때문이다.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람객과의 실랑이는 끊이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없어진 절 터에서 절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유구가 하나 둘씩 노출됐고, 발굴에 참여한 조사원들은 자연 신바람이 났다.
정리=신준봉 기자
inform@joongang.co.kr


![50마리 구조해 절반 죽었다…'개농장 급습' 라이브 방송 실상 [두 얼굴의 동물구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e5e5af3-4691-482d-a87f-a730a3b763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