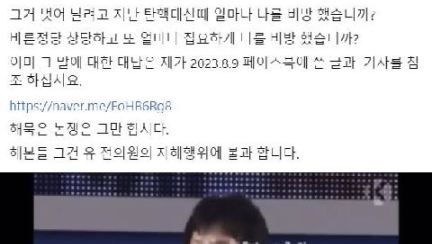LG카드 사태가 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말까지 1조2000억원을 증자하지 않으면 LG카드는 파산의 위기에 몰린다.
채권금융기관들은 LG카드의 전 소유주인 LG그룹에 추가 증자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LG그룹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만일 채권단과 LG그룹 간의 막판 협상이 끝내 실패하면 LG카드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과 LG그룹 모두 거액의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 LG카드 가입자와 가맹점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금융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LG카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은 정부와 채권단에 있다고 본다. 물론 당초 LG카드를 부실에 빠뜨린 원초적인 책임은 대주주였던 LG그룹에 있지만 LG그룹은 지난 1월 회생방안에 따라 일단 자기 몫의 부담을 졌다. 이 점에서 LG카드가 1년도 못 가 다시 좌초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당시 허술한 회생방안을 만들고 합의해준 채권단과 이를 막후에서 조정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LG그룹이 당초의 합의안을 이행했다고 해서 현재 불거진 LG카드 사태를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떳떳한 자세는 아니다. LG그룹은 정부와 채권단이 합의안에 없는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원리'로 보더라도 LG그룹이 LG카드의 회생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LG그룹이 대주주로서의 책임은 면했지만 현재 LG카드의 최대 채권자로서의 책임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LG그룹은 LG카드가 청산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돼 있다. 그럼에도 LG그룹이 채권단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LG카드의 회생부담을 모두 채권금융단에 떠넘긴 후 나중에 득만 챙기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보인다.
LG그룹은 시장원리에 맞게 응분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