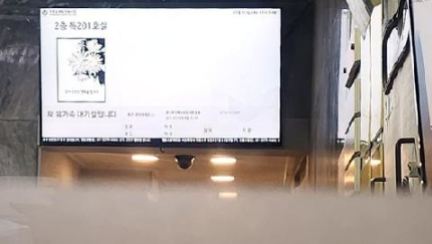얼마 전 회사 동료들과 파스타를 먹으러 갔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파스타 같은 건 먹고 싶지 않다. 다만 동료들이 “부장님은 된장찌개 같은 것만 좋아하시죠?”라는 소리에 항의하는 심정으로 “뭘 모르는군. 나 이래봬도 집에서도 파스타 해먹는 남자야”라고 말한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김상득의 인생은 즐거워
동료들은 봉골레 파스타와 알리 올리오를 주문한다. 아침저녁으로 파스타를 해먹는다고 큰소리친 나는 토마토소스의 해산물 파스타를 선택한다. 동료들의 대화에 끼지 못한 나는 파스타를 짬뽕처럼 먹다가 돌이 들어있는 걸 발견한다.
“여기 돌이 들어있어.” “조개겠죠. 부장님도.”
“정말 돌이라니까.”
“돌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 참 왜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그럼 돌이겠죠. 부장님이 돌이라면.”
정말 돌인데. 그들은 내 말을 안 믿고 나를 돌 취급한다.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다. 몇 년 전 ‘오물오물사건’ 때도 그랬다.
임신 중이던 김 주임은 집에서 가져온 아침을 자기자리에 앉아 오물오물 먹곤 했다. 물론 혼자만 먹기보다 동료들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았다. 그날도 김 주임은 식빵에 잼을 발라서 팀원들에게 나눠주었다.
“팀장님도 식빵 드려요?”
다른 동료에겐 묻지도 않고 주면서 왜 내게만 그걸 묻지, 하는 속 좁은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좁은 속을 채울 요량으로 이렇게 말했다.
“배 부른데. 그럼 한 쪽만 먹어볼까?” “네!”
대답은 씩씩했지만 식빵은 무소식이다. 눈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신경은 온통 식빵 한 쪽의 부드러움과 딸기잼의 달콤함에 가 있었다. 김 주임이 조금 바쁘다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챙겨 줄 거라고. 스스로에게 타이르며 입안 가득 고인 침을 수십 번도 더 삼켰다. 두 시간이 지난 것이다. 결국 나는 부끄러움도 잊고 한 마리 모기가 되어 김 주임 귀로 가서 속삭인다.
“김 주임, 나 왜 빵 안 줘?” “네?”
모기의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 주임은 큰 소리로 대답한다.
“아까 드렸잖아요.” “언제?”
“팀장님도 참. 아까 제가 드려서 드셨잖아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정말 안 받았다니까.”
김 주임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오 대리를 찾는다. 정작 억울한 사람은 나인데.
“오 대리님, 제가 아까 팀장님께 빵 드렸죠?”
“네, 아까 팀장님이 오물오물하는 걸 봤어요.”
나는 이남이처럼 울고 싶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배를 갈라 죽음으로 결백을 입증하고 싶었다.
“아니, 옆에서 오물오물하는 게 보여?”
오 대리를 대신해 남 주임이 한마디 거든다.
“그럼요. 팀장님은 수염 때문에 조금만 오물거려도 확실히 알 수 있죠.”
이쯤 되면 확신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어쩌면 나는 식빵을 먹고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나는 괴벨스가 말한 대중이 된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거짓말을 믿고 마는 대중. 그때는 그랬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게는 돌처럼 확실한 물증이 있다. 나는 분함을 참지 못하고 고함을 친다.
“이게, 이게 조개라고?”
내 목소리가 너무 컸던 것일까? 놀란 그들은 주위부터 돌아본다. 내가 부끄러운 것이다. 그들은 내가 포크로 들어올리는 돌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한다. “뭐, 돌 맞네요. 부장님, 이제 됐어요?”
부부의 일상을 소재로 『대한민국 유부남헌장』과 『남편생태보고서』책을 썼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