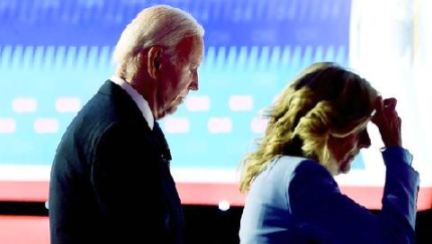한·일 역사공동위원회가 2년9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40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어제 2기 활동을 종료했다. 양국 역사학자 각각 17명으로 구성된 2기 위원회는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설을 공식 폐기하는 등 1기 때에 비해 진전된 성과를 거뒀다. 을사늑약, 일제강점기 근대화 등 여러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독도나 종군위안부, 한·일 강제병합의 불법성 등 민감한 이슈는 논의조차 못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서 구체적 합의를 이뤄낸 점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일본이 4~6세기 가야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은 ‘사실이 아니며, 용어 자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고서에 명기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일본이 한반도 침략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활용돼 온 이 가설이 허구였음을 양국 학자들이 공인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일본의 벼농사와 금속문화는 한반도에서 전래된 것이 맞고, 임진왜란은 일본이 내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며,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민족적 차별이 존재했다는 점을 인정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 같은 성과를 교육용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역사교과서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2001년 일본 후소샤(扶桑社)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역사 인식의 차이 극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상 간 합의로 1기 위원회가 발족한 것이 2002년 3월이었다. 역사는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구명(究明)할 대상이지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현격한 역사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유럽은 수십 년에 걸친 공동연구 끝에 역사교과서를 공유하는 단계까지 왔다. 위원회 발족 8년 만에 이 정도 성과를 이뤄낸 것만 해도 큰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은 후세를 위한 주춧돌을 쌓는다는 자세로 역사 공동연구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다.


![50마리 구조해 절반 죽었다…'개농장 급습' 라이브 방송 실상 [두 얼굴의 동물구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e5e5af3-4691-482d-a87f-a730a3b763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