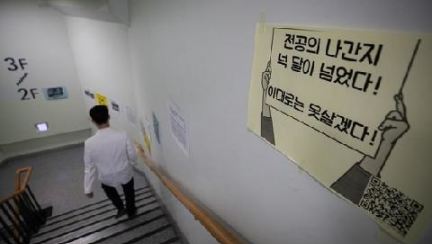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첫날 개헌론(改憲論)이 봇물 터지듯 제기되고 있다.
금융파업이니 의약분업이니 하여 뒤숭숭한 시국과 걸맞지는 않지만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기 시작한 개헌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수렴해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거론된 개헌론의 내용은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重任制)로 하자는 논의와 영토 조항을 조정하자는 두 가지다.
대통령 단임제는 군사 장기집권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입된 조항이다. 3선 개헌도 모자라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유신헌법을 제정해 사실상 종신 집권을 도모했던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감안해 5공 군사정권은 대통령 7년 단임제를 대안으로 내놨고 1987년 6.10항쟁 후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면서 임기만 5년으로 줄었다.
그나마 이 5년 단임제가 지켜지면서 6공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마침내 여야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던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장기집권 방지라는 측면을 너무 강조했던 5년 단임제도 한 대통령이 그의 정책적 의지를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점, 레임덕 현상에 따라 국가통치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내각제적 요소가 일부 뒤섞인 현 정부체제를 순수한 대통령제에 맞게 조정하는 것 등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 작업은 단임을 약속하고 당선한 현 대통령이나 또는 차기 대통령에게 바로 적용돼서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크다.
경우에 따라선 권력의 장기화에 대한 의혹과 이를 둘러싼 심각한 정쟁과 지역대결 심화 등 그야말로 소모적 국론 분열을 부를 소지가 크다.
때문에 임기 조항을 고치려면 최소한 차차기(次次期)정도 앞을 내다보고 순수하게 통치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영토와 관련한 헌법 제3조 개정 논의는 정말 경솔하다.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제3조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전문(前文)이나 제4조와 연관돼 있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과 아무런 법적인 충돌이 없다.
다만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규정이 문제라면 관련 하위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이 문제 역시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충분히 정리된 문제다.
그런데도 영토 조항을 고치거나 유보하자는 의견들은 스스로 통일 노력의 논거를 없애는 경망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정부측이 일단 어떤 개헌의사도 없다고 밝힌 점은 다행스럽다. 개헌 논의는 보다 신중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