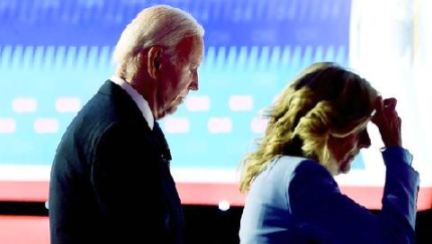-현재는 의사가 의료기관 한 곳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후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의원을 추가로 여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탈세가 횡행한다. 후배에게 월급을 주고 나머지는 선배 의사가 가져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법을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병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네트워크(체인) 형태의 병원들이다. 지분을 서로 출자한 데가 일부 있고 이익 배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 밤에 원장끼리 만나 이익을 배분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 복수 개설 금지 조항 때문에 생긴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여러 개의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법인은 되고 개인 의사는 안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규제가 의사들의 조세포탈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언제부터 의사만 의료기관을 만들 게 됐나.
“1944년 조선총독부에서 최초의 법령이 만들어졌다. 73년에 의료법의 큰 흐름이 바뀐다. 73년 이전에는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자격에 제한이 없었으나 73년부터 의사들에게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줬다. 이전까지는 누구나 허가만 받으면 병원을 만들고 의사를 고용할 수 있었다. 병원을 만들 수 없는 의사들은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 의료 면허는 엄밀히 따지면 (의료) 행위에 대한 독점권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은 개설 독점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누구나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인가.
“그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에게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하면 ‘사무장 병원’(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여는 것)이 마구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갖춘 주식회사만 병·의원을 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의료인이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해 감시하면 된다.”
특별취재팀=신성식·안혜리·강기헌 기자, 박태균식품의약전문기자
◆투자개방형 병원=병원은 학교법인(세브란스병원), 사회복지법인(서울아산·삼성서울), 의료법인(미즈메디병원), 국공립병원 등으로 나뉜다. 이들은 비영리 기관이라 외부에서 투자할 수 없다. 80%가 자금 부족에 시달린다. 이들 병원에 외부 자본이 투자해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면 투자개방형 병원이 된다. 이들 외에 개인병원과 동네의원이 있는데 영리 기관이지만 주식회사 병원 전환은 금지돼 있다.


![50마리 구조해 절반 죽었다…'개농장 급습' 라이브 방송 실상 [두 얼굴의 동물구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e5e5af3-4691-482d-a87f-a730a3b763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