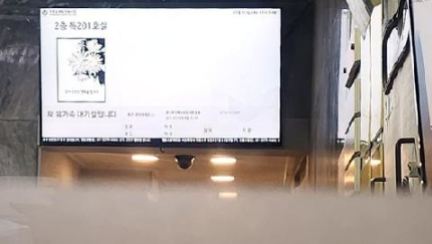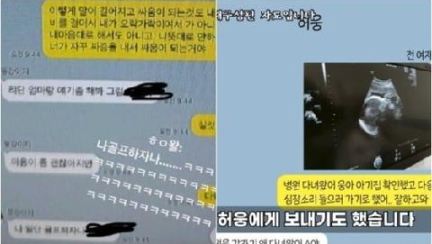한 시간 전부터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있다.
남편은 모른다
“뭘 봐요?” “그냥.”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다. 다만 남편은 글을 써야 하는데 소재가 떨어진 것이다.
“왜 글이 안 써져?” “그런 것 같아.”
“폴록에서 온 남자가 다녀갔나 보네.”
‘폴록에서 온 남자’는 영감을 빼앗아 가는 남자다. 원래는 돈을 빌리기 위해 시인 콜리지를 찾아간 남자다. 그때 시인에게 위대한 영감이 떠올랐는데 폴록에서 온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돈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 휘발성 강한 영감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아내 말처럼 폴록에서 온 남자가 다녀간 것도 아닌데 남편은 소재가 떨어졌다. 글감이 떨어지면 낭패다. 땔감 떨어진 겨울밤 아궁이처럼.
남편은 글감이 궁하거나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면 항상 아내를 바라보았다. 필요하다면 남편은 언제든 아내를 팔아 글을 썼다. 아내는 소재의 노다지 금광이다. 남편은 쓸 거리가 없으면 아내를 본다. 그러고는 곡괭이를 들고 아내의 광산으로 달려간다. 남편은 캐고 또 캔다. 광부는 광산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매장량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남편은 아내의 막장에서 글감을 파낸다. 그렇게 파내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남편이 다 파버린 아내의 속도 모르고 누군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
“얼마나 좋아. 착한 남편과 함께 사니까.”
그 사람은 착한 남편의 곡괭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럴 때마다 착한 광부와 함께 사는 아내의 억장이 무너진다. 아내의 속을 누가 알랴. 남편은 모른다. 이웃도 모른다. 친구도 가족도 모른다. 아내는 한숨을 쉬면서 말한다.
“한번 살아보세요.”
남편이 쓰는 칼럼에서 언제나 착한 역은 남편이고 악역은 아내 몫이다. 그것은 칼럼을 쓰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며 또한 기록하는 자가 거두는 승리다.
‘남편은 모른다’라는 칼럼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을 줄 알았다. 할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은 줄 알았다. ‘폴록에서 온 남자’가 이렇게 빨리 다녀갈 줄 남편은 몰랐다. 인생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본다.
“뭘 봐요?” “그냥.”
“할 말 있음 빨리 해.”
“할 말은 무슨? 좋으니까 그냥 보는 거지.”
아내는 남편을 곱게 흘겨보고, 그런 아내를 남편은 바라본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칼럼을 쓰면서 남편은 아내의 속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글 김상득
※‘남편은 모른다’는 이번 회로 막을 내립니다.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들을 맛깔나는 필치로 전하는 새 코너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부부의 일상을 소재로 『대한민국 유부남헌장』과 『남편생태보고서』책을 썼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