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상근자들은 "왜 시민운동을 하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
생계비에 턱없이 못미치는 보수, 불투명한 미래 등을 따지자면 아직 '직업으로서의 시민운동' 은 매력적이지 않다. 우리에게 "희생정신 없으면 못하는 일" 이라며 격려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운동이 언제까지 '희생정신으로 봉사하는 사람' 만의 전유물이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시민운동은 공생 (共生) 을 위해 함께 힘을 쏟아야 할 우리 모두의 몫이다.
국가는 질서유지와 사회에 대한 규제에 더 많은 기능을 할애할 뿐 시민생활 속에 드러나는 무수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익숙치 않다.
기업은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기업이 반복적인 광고를 통해 인간과 이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이윤 확보를 위한 마케팅전략일 뿐이다.
소비자로서,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환경의 향유자로서 시민들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무분별한 개발에만 관심있는 개발당국과 업체들에 맞서 환경을 지키는 것도, 내가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감시하는 것도, 내가 뽑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이익단체의 편만 들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지 감시하는 일도, 기업이 사회에서 얻은 이윤을 다시 환원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도 결국 우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일에 다름아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국가와 기업의 영역이 커지는 만큼 그 활동을 감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시민운동의 영역도 커져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민운동의 영역이 사회의 기본영역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 바탕에는 시민운동단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부와 자원봉사를 아끼지 않는 다수의 시민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도 머지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 믿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하는 시민운동가들만의 시민운동이 아닌 '다수 시민에 의해 커가는 시민운동' 으로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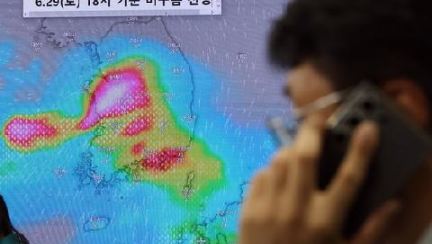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