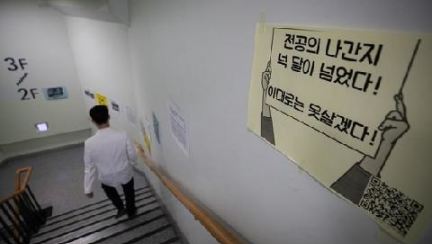“한국 춤을 어떻게 세계인들에게 선보일까 고민하다 지명도와 보편성이 있는 공자를 소재로 삼게 됐습니다.”
올해 25회째를 맞은 공자문화제에 외국 공연단으로는 유일하게 초청을 받은 임 교수를 현지에서 만났다. 이화여대에서 무용을 전공한 그는 1988년 서울올림픽 폐막식 ‘떠나가는 배’를 안무했고, 서울무용단 단장을 지냈다.
성균관대 무용과 재학생과 졸업생, 임교수가 이끄는 무용단 ‘댄스위(dance we)’ 소속 배우 등 40여 명이 함께한 이날 공연은 공자의 탄생·학문·고난·임종과 부활 등 5막으로 이뤄졌다.
탄생 장면에서는 공자가 10여m 붉은 천으로 표현된 탯줄을 끊고 미혼모였던 어머니 안징재(顔徵在)의 몸속에서 나오는 장면을 실감 나게 묘사했다.
이어 공자가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悅乎)”를 비롯해 논어의 유명한 구절들을 읊조리는 장면, 위나라 왕비였던 남자(南子) 부인이 공자를 유혹하는 현란한 춤사위, 거문고를 켜며 이런 고뇌를 극복하는 공자의 인간적 모습, 죽간을 들고 제자 안자(晏子)와 치열하게 학문을 탐구하는 모습 등을 파노라마처럼 그려냈다.
중국 인민해방군 가무단이 창작해 전날 초연한 『공자』와 임 교수의 『공자』를 모두 지켜본 무용평론가 이상일씨는 “중국 작품이 스케일을 내세웠다면 한국 작품은 표현력에서 완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임 교수와의 일문일답.
-공자의 고향에서 전막을 공연하긴 처음인데.
“2003년 공자문화제 때 죽간을 소재로 한 춤을 일부 공연한 적은 있지만, 창작 무용 ‘공자’의 전막을 중국 무대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이번 작품은 2004년 한국 예술의전당에서 초연했고, 2006년에는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으로 유네스코 초청으로 파리에서 공연했던 작품을 손질한 것이다.”
-어떤 부분을 수정했나.
“공자 생애 소개를 줄이고,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는 마음에 초점을 맞췄다. 공자 사상의 핵심인 인(仁)은 상대에 대한 배려인데, 그것을 춤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유학을 별도로 공부했나.
“대학원생들과 함께 3년간 옥편을 찾아가며 고전문헌 속에 숨은 춤의 원형을 찾아냈다. 유학과 교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36명이 가로와 세로로 줄지어 추는 육일무가 인상적이었다.
“공자의 사상인 공경·사양·겸양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 16세기 조선 문헌을 고증해 무보(舞譜:춤동작을 악보처럼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것)를 만들고 이를 춤 동작으로 복원했다.”
-공연에 사용한 음악은.
“공자에게 제를 올릴 때 쓰는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 국악합주곡인 수제천(壽齊天), 공무도하가 등을 사용했다. 신혜영 음악감독이 이 작품을 위해 별도 창작한 작품도 사용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에 베이징(北京)에서 ‘공자’를 다시 무대에 올릴 생각이다. 공들여 복원한 팔일무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재도 추진중이다.”
취푸(산둥성)=장세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