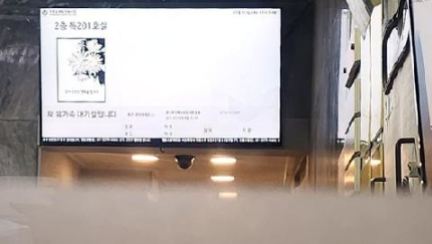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가 대립형인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에 다선 (多選) 의원이 나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초선보다는 재선의원이, 재선의원보다는 3선 이상의 관록을 가진 의원이 집행부의 독주를 더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3선의원의 탄생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충북도의회의 경우에는 3선의원이 한명도 나올 것 같지 않다.
재선의원 모두가 지방정가를 떠나 생업에만 전념하겠다는 결의 (?) 를 공공연히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은퇴하겠다는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가 아니다.
충북도의회 재선의원 8명의 평균연령이 54.6세여서 나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들은 이젠 더이상 '명예' 도 싫다고 한다. 왜일까. 한마디로 회의와 무력감 때문이다.
"의욕을 보이려 해도 제도적 한계와 거대한 관료집단의 성벽 앞에 번번히 좌절해야 했다" "주민들은 민원해결사로 여기고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말로만 공명선거지 돈쓰지 않고는 당선이 힘든 선거판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 등등. 한마디로 7년간의 의원생활이 주민대표로서 뜨거운 성취감을 안겨주기보다는 시간과 돈만 할애해야 하는 '짐' 이었다는 얘기다.
스스로 지방정가를 떠나려는 이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한 지방자치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꼬여가는 느낌이다.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는 의원들만의 몫이 아니다.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주민들의 구태, 독선과 무성의가 습관화된 집행부, 그리고 한정된 권한만을 부여한 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중앙정부 모두가 지금 한번쯤 뒤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