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좀 풀렸다고 금리를 올리면 역효과가 더 크다. 과잉 유동성 문제는 나중에도 해결할 수 있다.”
연세대 상경대에서 주는 제2회 ‘조락교 경제학상’을 받기 위해 이날 한국을 방문한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잉글랜드은행 고문,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을 지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문 교수도 맡고 있다.
-변동성 지수 의 하락 등 지난주 미국 금융시장에서 회복의 기미가 보였다.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최근 말했듯 ‘자유낙하’는 끝난 것 같다. 그러나 곧 바닥을 치고 회복될지는 알 수 없다. 금융부문의 부실자산 문제는 그대로다. 실업률이 계속 오르는 만큼 소비도 줄 것이다. 가뜩이나 의료보험 비용 등으로 재정 상태가 안 좋았는데 부실자산 처리 비용이 더해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국내에서도 경기 부양 탓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자산 가격만 보고 과잉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 단기부채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지금은 실물경제 침체기다. 일부 과열된 현상을 잡겠다고 이자율을 올리는 등의 대책을 낸다면 역효과가 더 크다.”
-미국도 영국처럼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나.
“물론 영국은 국가 부채 측면에서 미국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이 미국 국채, 모기지업체의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단순히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기축통화가 바뀌는 건 아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완전히 쇠퇴하고 신용도가 낮아져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당분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다음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해법은 .
“스위스처럼 은행들의 레버리지(자금 차입)를 직접 규제하는 게 한 방법이다. 스페인처럼 손실이 나기 전에 대손충당금을 미리 적립하게 할 수도 있다. 은행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제도도 도입할 만하다.”
김필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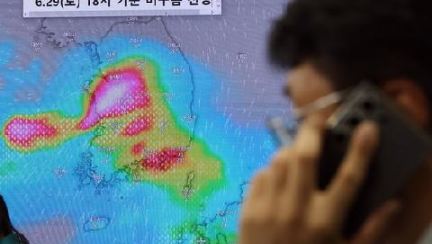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