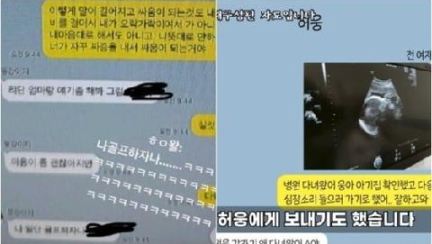창조적 파괴를 주창한 경제학자 슘페터는 “불황기는 역전의 시기”라고 말했다.
창조적 파괴를 주창한 경제학자 슘페터는 “불황기는 역전의 시기”라고 말했다.
경기순환과 관계 없이 시장에서는 늘 기업 간 추격전이 벌어진다. 하지만 불황기에는 추격과 역전이 더 빈번하고 극적으로 일어난다. 한 가지 요인은 불황기에 기술체계나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무섭 수석연구원은 "불황기를 겪으면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 영역이 열린다”며 “이때가 기존 기술에 몰려있던 선두 기업이나 시장 지배자에겐 위기”라고 말했다.
위기 때 기회를 잡아 선두 업체를 따라잡거나 위기를 넘긴 사례는 숱하게 많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시리얼 시장 1위는 포스트였다. 켈로그는 격차 큰 2위였다. 공황이 닥치자 포스트는 원가 관리와 마케팅 축소에 나섰다. 반면 켈로그는 광고를 더 늘렸다. 심지어 1930년대 초까지 극빈자들에게 시리얼을 무료로 배급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공헌 마케팅을 폈다. 차츰 시리얼은 미국 가정의 아침 식탁에 오르게 됐다. 켈로그는 시장 1위로 올라섰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신일본제철이 세계 1위 철강 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을 추격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장기 불황기였던 1996~2005년 동안 순이익의 70%를 R&D(연구·개발)에 쏟아부은 과감한 투자였다. 미국 코닝은 IT 거품이 꺼지면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12개의 공장을 폐쇄해야 했다. 그러나 코닝은 연구개발비를 줄이지 않았다. 특히 R&D 비용의 30% 정도를 중장기 연구에 투입했다. 코닝은 지난해 액정 TV용 유리기판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하면서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추격 ‘엔진’은 기술과 창조적 마케팅
불황기에 선두주자가 격차를 더 벌리느냐 아니면 후발주자가 좁히거나 역전하느냐는 전략에 달려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기고를 통해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격차를 벌리거나 추격에 성공한 기업은 기술을 혁신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다”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요즘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현대자동차처럼 리스크를 감수한 과감한 마케팅도 빼놓을 수 없다.
이재술 딜로이트컨설팅 대표는 "경기가 하강할 때엔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위기 초기 때 선제 대응에 성공하는 기업은 서둘러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사업을 선택해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택한다. 반면 안이한 자신감이나 무력감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기업은 기껏해야 불분명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위험 분산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SK텔레콤, 신세계, 유한킴벌리, 웅진코웨이, 쿠쿠홈시스, 하나코비 등 사례를 분석해 격차를 좁히거나 벌릴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추출해냈다.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pin21@joongang.co.kr
* 이 기사 전문은 3월 2일 발간되는 중앙일보의 경제 위클리 이코노미스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