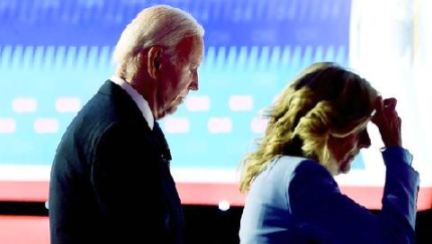창작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가 8일 서울 연지동 두산아트센터 연강홀(620석)에서 막을 내렸다. 공연계 가장 성수기인 연말을 끼고 2개월 남짓 이어졌으나 공연은 1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지난해 초 대학로 소극장 무대에서 초연됐을 땐 4억원 넘게 벌어들인 작품이다. 근데 왜 이번엔 손해를 봤을까. 경기불황 때문? 혹은 소극장에서 중극장 무대로 옮기면서 작품 질이 떨어져서?
최민우 기자의 까칠한 무대
‘형제는 용감했다’의 흥행 실패는 두산아트센터 연강홀로선 뼈아프다. 2007년 10월 재개관한 이후 ‘텔 미 온 어 선데이’를 시작으로 ‘아이 러브 유 비코즈’ ‘나쁜 녀석들’ ‘컴퍼니’ ‘제너두’ 등이 줄줄이 망해간 전철을 고스란히 밟았다. 뮤지컬 매니어 위주의 작품이며, 극장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점 등이 원인으로 등장하지만 이것만으로 이 공연장에 내린 흥행 저주를 설명할 수 있을까.
시설이 나빠 관객이 찾지 않는다면 또 모르겠다. 두산아트센터는 자타공히 국내 최고 시설을 자랑한다. 리모델링하는 데만 무려 250여억원의 돈을 쏟아부었다. 고품격 문화 공간의 모양새다. 어디서나 라벤더 향을 맡을 수 있고, 로비와 통로는 갤러리처럼 꾸몄다. 은은한 불빛, 고급스러운 바닥과 외장, 깔끔한 실내 카페 등도 눈길을 끈다. 특히 여성 관객이 기존 공연장에 갖는 가장 큰 불만인 ‘줄 서는 화장실’을 탈피하고자 양변기도 52개로 늘렸다. 이 정도면 특급 호텔에 뒤지지 않을 정도다. 그래서 개관했을 당시 “공연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냥 구경 삼아 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란 말까지 나왔다.
그런데 이 지점, 바로 관객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점이 역설적으로 두산아트센터 흥행 실패의 숨은 비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연강홀 내부를 살펴보자. 좌석 앞뒤 간격이 1.2m(타극장 평균 0.9m)에 이른다. 앉은 상태에서 사람이 지나가도 불편하지 않다. 의자도 푹신하며 팔걸이도 넉넉하다. 중간 통로도 널찍하다. 구석구석 극장 측의 배려가 담겨 있다.
그러나 막상 자리에 앉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안락한 좌석은 때론 졸음을 재촉한다. 다소 간격이 있는 좌석 간 틈바구니에서 관객의 응집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널찍한 공간 때문에 관객이 다 들어차도, 마치 반밖에 차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당연히 관객이 극에 몰입하는 걸 방해한다.
이는 관객만이 아니다. 무대에 선 배우도 마찬가지다. ‘형제는 용감했다’에 출연한 한 배우는 “마치 허공에 대고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 거대한 벽과 마주선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공연은 라이브다. 무대와 객석 간의 팽팽한 충돌에서 작품은 하나씩 완성돼 간다. 느슨하며 긴장감이 없는 관객을 대하면 배우 역시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
몇 년 전 런던 웨스트엔드에 가 본 적이 있다. 그곳의 공연장은 대부분 100년이 넘는 낡은 건물들이다. 특히 눈에 거슬린 건 좁은 좌석이었다. 게다가 중간 통로 없이 양쪽 사이드를 통해서만 자리에 앉아야 했다. 어쩌다 가운데 자리라도 얻게 되면 좋긴커녕, 앉아 있는 덩치 큰 서양인을 일으켜 세우고, 몸을 비집고 들어가는 통에 진땀을 빼곤 했다. 그러나 다닥다닥 붙어 놓은 통에 객석의 밀착도는 높았고, 자리가 조금 비좁은 탓에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작품에 최대한 집중했다. 약간의 불편함은 오히려 공연 관람의 플러스 요인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무조건 쾌적하고 편안하다고 좋은 공연장은 아닌 것이다.


![50마리 구조해 절반 죽었다…'개농장 급습' 라이브 방송 실상 [두 얼굴의 동물구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e5e5af3-4691-482d-a87f-a730a3b763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