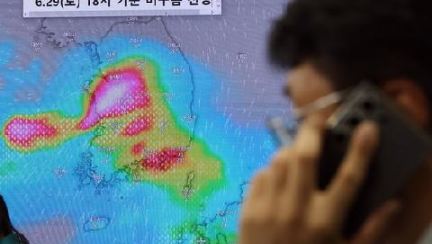서울 명동의 밀리오레 빌딩 지하에는 ‘자오핑(兆平)’이라는 중식당이 있다.
광둥요리와 딤섬을 주 메뉴로 해 800석 규모를 갖춘 대형 식당이다. 중국·동남아 관광객들이 “먹을 게 없다”는 불만을 쏟아놓는 데 충격을 받아 대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이 2년 전 개업했다.
‘6채(菜)1탕(湯)’에 1만원 안팎의 값으로 손님을 받는다고 한다. 내부는 중국풍(風) 일색이다. 중화권에선 그동안 한국을 ‘3무(無) 관광지’라고 깎아내렸다. 먹을 것, 볼 것, 살 것이 없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서울 번화가와 시장·백화점·지하철을 걷다 보면 일본어·중국어를 듣는 일이 부쩍 늘었다. 삼삼오오 짝지어 다니는 관광객들의 목소리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658만 명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엔고 시대를 맞이한 일본(237만 명)에서 많이 온 덕택이다. 중국 대륙을 비롯한 중화권(약 174만 명)도 증가 추세다. 수출 감소 속에 경기가 꺼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반가운 현상이다. 관광산업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외화 벌이’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보다 두 배나 크다.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같은 나라의 관광산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는다. 한국은 고작 4%다.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홍콩·마카오는 연 1500만 명 이상을 끌어들여 성장 동력을 키워나간다.
그런 점에서 한국 관광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환율이라는 유리한 변수에도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관광 인프라나 서비스는 구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 측에서 얼마든지 관광객을 더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여행사들이 쓸 만한 호텔·식당을 못 구해 발을 구르는 실정이다. 외국어 불통(不通)을 비롯해 혼잡한 교통, 비싼 물가, 안내표지판 미비,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은 외국인들의 불만거리다. 낯선 도시에 온 그들의 눈높이가 돼 시내를 다녀보면 공감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비싼 가격의 메뉴판을 내미는 식당,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는 업소도 있다고 한다.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한국에 다시 와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까.
세계 관광산업은 기본 욕구 단계를 벗어나 교육(education)·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자극(excitement)이라는 ‘3E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36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한 게 열악한 경쟁력을 잘 말해준다. 관광산업은 지자체·관련 업계·시민들이 하나가 돼 국가 브랜드의 전도사를 자임할 때 뻗어나갈 수 있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국내외 관광객의 불만 해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3무 관광’의 오명을 벗고 ‘그린 성장’ 시대로 가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