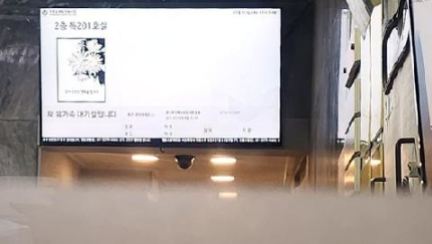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부동산 투기 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엊그제 입법예고됐다. 지금은 국세청 등이 투기 혐의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특정 점포에 대해서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7월 말부터는 본점에서 해당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금융실명제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돼야만 유지될 수 있다. 금융실명제법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금융거래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일괄조회 대상을 5억원 이상 부동산 거래 중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 증빙을 낸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허위 증빙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과세당국의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자의 금융거래 정보는 행정당국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뒤져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계좌추적권이 남용되고, 여기에서 습득한 금융거래 정보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장치도 없다. 결국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명분을 앞세워 투기 혐의자의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알아보려는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이로 인해 금융실명제의 본질이라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기관이 손쉬운 무기인 계좌추적권에 유혹을 느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독자적 계좌추적권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작용이 클뿐더러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도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엔 불충분하다. 쥐를 잡으려다 장독을 깨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