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생전에 남겼던 일화 중 으뜸은 영국 런던을 쓰러뜨렸던 ‘봉이 정선달’ 노릇이다.
세상이 알듯 1971년 조선소 차관 협상 때 한참 궁하던 왕회장은 지갑을 꺼내들었다. 당시 500원짜리 지전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상대의 코앞에 들이대며 “이게 우리 조상이 500년 전 만들었던 철갑선”이라고 큰소리쳤다. 울산 현지에 박은 말뚝 몇 개가 전부이던 상황에서….
뿐인가? 자동차·반도체에 뛰어들 때도 무모했다. 세계 시장은 포화상태이고, 한국은 경쟁력이 없다며 누구나 고개를 흔들었다. 그게 비교우위를 가르치는 경제학 교과서의 논리다.
그런 정설을 믿고 봉제품·수산물 수출만 줄창 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딱 중남미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왕회장은 달랐다. 입버릇처럼 “해보기는 했어?”라고 물었고, ‘길 없는 길’을 떠났다. 세계사의 빅 푸시(big push)로 통하는 70년대 중화학공업이라는 대도박도 그래서 가능했다.
그 후 30여 년, 도깨비가 등장했다. 왕회장과 한국 경제의 선택이야말로 미친 짓이 아니라는 것, 그게 경제발전의 왕도(王道)라고 밝힌 것이다. 그가 ‘올해의 지식권력’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사다리 걷어차기』는 결국 그런 얘기다. 18세기 산업혁명 이래로 유럽은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부자나라가 됐다. 자율영역이라는 시장이 절로 굴러가는 일은 결코 없었다.
때문에 부자나라, 대기업이 되려면 어찌해야 하나? 올리브 나무를 기르거나 봉제품을 만지작거리지 말고 초일류에 도전하는 ‘미친 짓’을 벌여야 하고, 무엇보다 국가가 앞장을 서야한다. 그런 초일류의 사례가 고급 차 렉서스인데, 그걸 만드는 도요타는 본래 ‘비단장수 왕서방’ 출신. 즉 실크와 방직기를 만들다가 1930년대 자동차에 뛰어들어 오늘의 대박으로 이어졌다. 그 점 말 된다. 비교우위로 하자면 도요타는 지금도 비단이나 짜고 있어야 옳다.
20세기 한복판에서 부자나라 반열에 오른 한국도 그렇다.
한국의 사례야말로 국가 중심의 중상주의 정책이 성공한 신데렐라 스토리다. 그의 주장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를 쓴 세계화론자 토마스 프리드먼에 대한 조롱·야유인데, 그럼 장하준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우리의 ‘미친 성장’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왜 멋진 현대사를 성난 얼굴로 돌아보나? 그것이야말로 제 살 깎아먹기다.
“18세기 후반부터 서구 선진국들의 소득이 2배가 되는 데 40년이 걸렸다. 반면 우리는 소득을 7~8배 향상시키는데 40년이 채 안 걸렸다. 소득분배까지도 이뤘다. 이 같은 결과와 절연(絶緣)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은 지금 개혁이라는 덫에 걸린 상태다.”(『개혁의 덫』)
장하준은 이렇듯 소모적 이념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우리를 돕지만, 메타담론에도 썩 유효하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 묶을 경우 폭발적인 문화이론으로 발전시킬 여지가 풍부한데, 누가 그것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학문이건, 비즈니스를 하건 바다 건너 저쪽에 주눅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 말이다. 그걸 암시한 ‘경제학자+문화이론가’ 장하준에 대한 해독작업은 지금부터다.
조우석 <문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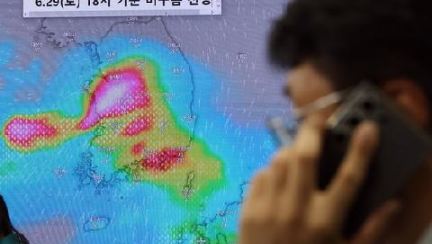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