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FA(축구협회)컵이 해를 거르지 않고 파행을 겪고 있다.
석연치 않은 심판판정과 이에 불복하는 구단의 항의로 해마다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강전에서는 방승환(인천)이 판정에 항의해 유니폼을 벗고 심판에게 항의하다 1년간 출전정지의 징계를 당했다. 5일 포항과 성남의 8강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심판 판정에 대한 성남 구단의 항의로 한동안 경기가 중단됐다. 한국 축구의 갖가지 문제는 심판 판정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출발한다.
#학교축구 때부터 시작된 판정 불신
대다수의 학교축구 지도자들은 학부모의 찬조금에 의존해 팀을 운영한다. 여기에다 학부모의 돈을 받아 심판 로비에 쓰기도 한다는 게 축구인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공부는 제쳐두고 운동만 했기에 진학을 위해서 편법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심판 때문에 졌다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이게 들으며 성장한 선수들이 심판을 우습게 보는 건 당연하다. ‘심판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렬하게 분노하는 것이다. 심판을 ‘공정한 경기를 하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경기를 즐기는 유럽의 유소년 선수와는 시작부터 다르다.
# 학부모 돈 받아서 심판에게 로비
곪은 것은 심판계뿐만 아니다. 심판에게 로비하겠다고 돈을 거둬 슬쩍 다른 곳에 쓰는 지도자도 많다. 한 심판은 “이런 지도자일수록 패할 경우 잘못이 없는 심판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많다. 주위의 학부형을 의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심판 로비로 이득을 본 경험이 있는 팀일수록 조금만 판정이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해 크게 흥분한다”고 말했다.
#FA컵에서 사고가 많은 까닭은
K-리그는 1996년부터 축구협회에서 분리된 자체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임 심판제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 감독이 비교적 투명하고 엄정하다. 무선 마이크와 헤드셋을 구비하는 등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K-리그 심판들을 FA컵에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밥그릇 싸움이다. 최창선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협회 1급 심판에게 중요한 경기를 맡기면서 기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어 FA컵에 배정했다. 하지만 FA컵 4강전부터는 프로 심판을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동안 왜 안 했는가.
#왜곡된 심판 문화의 해결책은
FC서울의 셰놀 귀네슈 감독은 “한국에 와서 선수들이 심판의 몸을 만지면서 항의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 유럽에서는 모두 경고감이다. 심판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갈 길이 멀다. 양분된 심판위원회를 합쳐서 독립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축구협회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독립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체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심판을 믿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축구협회가 할 일이다.
이해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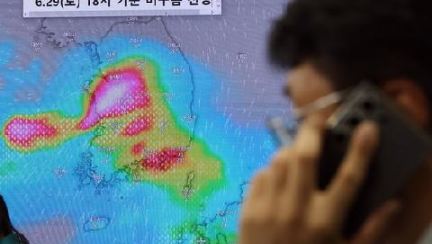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