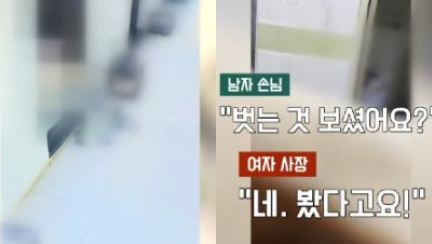앞뒤가 꽉 막힌 시장이다. 2100 고지에서 미끄러진 코스피는 기진맥진한 채 7부 능선을 겨우 붙잡고 있다. 1년도 안 돼 반토막이 난 중국펀드를 비롯해 해외펀드도 죽을 쑤긴 마찬가지다. 유가만 떨어지면, 달러만 강세를 보이면, 신용 위기가 해소되면 상승장이 올 것이라던 증권사들의 분석은 모두 공수표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펀드 수수료는 꼬박꼬박 빠져나간다. 자산운용사들은 평가액의 평균 0.74%를,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평균 1.29%를 해마다 떼어간다. 잡다한 수수료를 합해 펀드 투자자들이 이렇게 부담하는 비용이 한 해 2.09%에 이른다.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그저 펀드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 비용을 치러야 한다.
펀드 종주국인 미국보다 훨씬 많고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국내 은행과 증권사는 올 들어 매달 판매 수수료로 각각 1400억원, 850억원을 거둬들이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1조8000억원이나 된다. 자산운용사들의 운용 보수도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투자자들의 지갑이 그만큼 얇아진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수수료만큼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판매사로부터 편지 한 장 받아보지 못한 투자자들이 부지기수다. 받았다고 해도 ‘참고 견디라’는 내용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갑을 채워주지 못할 바엔 불안한 마음이라도 달래줘야 하건만, 뚜렷한 전망이나 논리를 제시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답답한 마음에 은행 창구를 찾아도 환매보다는 갈아타라는 권유만 받고 돌아서기 십상이다. 상승장에선 잠잠했던 불만이 서서히 높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판매사, 특히 은행은 요지부동이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수료가 낮은 온라인 펀드를 내놓긴 했지만 인지도와 판매망 부족으로 고전을 겪고 있다.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온라인 펀드용 계좌 개설을 위한 증권사와의 제휴를 거부하는 은행도 적지 않다. 온라인 펀드도 수수료가 높은 오프라인용을 그대로 베낀 게 대부분이다. 자산운용협회가 5월 말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니 온라인 펀드의 수수료는 1.96%로 오프라인 펀드와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암묵적인 담합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판매사들이 수십 곳이라지만 사실상 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예닐곱 개 은행들이기 때문이다.
주식거래 때 내는 수수료도 한때 0.5%나 됐던 적이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의 계속되는 경쟁과 업무 효율화로 지금은 최저 0.015%까지 떨어졌다. 지금 펀드 판매 수수료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소수의 은행들이 펀드 판매 창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계열사로 펀드운용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독자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내렸다가는 은행들로부터 왕따를 당할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합리한 수수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회사들이 모처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서비스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올림픽에서 봤듯이 코치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선수들이 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힘들어하는 고객을 그냥 떠나보내기보다는 달래고 추슬러 신뢰를 얻는 게 장기적으로 득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 증권사의 엘리베이터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고객이 떠나는 데는 10분, 다시 돌아오는 데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