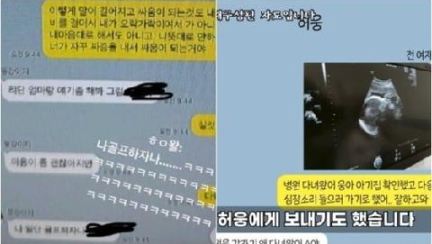투자자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글로벌 주가가 급락하면서 펀드 투자 손실액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고통이 크다. 올 들어 해외펀드에서만 줄잡아 8조원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시장은 악재에 포위돼 있는 형국이다. 치솟는 유가와 인플레, 미국의 경기침체와 중국의 긴축…. 나락의 끝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투자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소통의 부재’다. 허허벌판에 방치된 듯한 외로움이다. 해외투자 원정대를 모집하고 이끌었던 시장의 리더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 ‘통찰과 직관’ ‘참된 동반자’ 등 그들의 외침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벌써 몇 달째 반복되는 소리가 있긴 하다. “신흥시장의 성장성을 믿자. 길게 보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갈수록 신뢰가 떨어진다. 녹음기 소리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
공연한 투정이 아니다. 분명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다. 펀드 판매수수료 얘기다. 연 평균 1.5%의 수수료가 매일매일 나뉘어 떨어져 나간다. 지난해 판매수수료 인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른 적이 있다. 금융감독 당국까지 나서 인하를 독려했다. 그러나 시장의 리더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수준 높은 자산배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당한 비용이다. 우리의 정성이 깃든 서비스를 감안하면 오히려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들의 서비스는 결국 ‘꾹 참고 기다리자’는 게 거의 전부였다. 최근 영국계 HSBC는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탈출하라’는 투자 지침을 내놓았다. 당분간 보유 비중을 ‘제로’로 만들라는 파격적 내용이다. 제대로 된 판단인지를 떠나 그런 목소리를 고객들에게 낼 수 있다는 배포와 자신감이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펀드투자는 ‘성장성’만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묻어 두고 마냥 기다릴 요량이라면 우량주에 직접 투자하는 게 훨씬 실용적이다. 사람들은 ‘변동성’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함을 잘 알기에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탁하는 것이다. 해외 증시에 돈을 넣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고수익도 좋지만 불의의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재산을 지켜 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지난해 나온 ‘글로벌 스윙 펀드’에 투자자들이 환호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수익률이 나빠서만은 아니다. 시장과 상품을 넘나드는 탄력적 투자를 약속해 놓고는 특정 지역에 운용자산을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펀드업계의 리더들은 투자자들 앞에 당당히 나서 ‘소통의 묘(妙)’를 발휘해야 한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하면서 투자자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응당 펀드 판매수수료를 내려야 할 것이다. 투자자는 내 돈을 관리하는 시장 리더와의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것은 희망이기에 앞서 권리다.
![[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