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빌리고 얼른 집을 나섰다.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것도 뿌리치고 택시를 잡았다.
늙수그레한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신경쓰여 무릎 위에 놓은 책을 펼쳤다.
안표지에 「CH」라는 사인이 있었다.필기체로 흘려 쓴 굵은 만년필 글씨.미스터 조의 머리글자 서명일 것이다.자기 소장본이라는 표시인가.
『운전기사 노릇을 꽤 오래도록 해왔지만 이런 미인 모셔보긴 처음입니다.』 운전기사가 점잖고 약간 느린 투로 말을 걸어왔다.부담스러워 웃기만 했다.
『테레비에선 뵌 것같지 않고 영화배우십니까?』 『보통주부예요.』 짤막하게 가로막았다.
『허허어,그거 안됐네요.』 점쟁이 같은 말씨에 아리영은 저도몰래 항의하듯했다.
『보통주부가 어때서요.』 『…어때서가 아니라 재능이나 미모나남보다 뛰어난 걸 가지고 있는 분이 보통 그릇에 담겨 있으면 넘치게 마련이거든요.』 -넘쳐? 아리영은 언뜻 백미러에 비친 노(老)기사의 얼굴을 쳐다봤다.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이 아버지 나이쯤 돼보였다.한가지 일을 평생토록 골똘히 하다보면 어언간 생활철학에 통달케 되는가.감탄하는 한편으로 섬뜩했다.
아무도 없을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누가 온 것일까.열쇠로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보니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다.
『언제 오신 거예요?』 『좀전에.흑염소 납품 일로 올라왔소.
』 『저녁은요?』 『그 레스토랑서 염소요리를 시식하고 왔지.당신은?』 『생각이 없어요.』 식욕도 없었고 남편을 마주보는 것이 두려웠다.젖은 솜옷처럼 온몸이 무겁고 축축했다.목욕이나 하여 빨리 자고 싶었다.
욕조에 더운 물을 틀고 거품비누를 잔뜩 일궈 몸을 담갔다.미스터 조의 콧수염 감촉을 지워버리듯 비눗물로 온몸을 박박 문질렀다.거품비누에서는 백장미 향기가 났다.아버지가 좋아하는 향기다. 목욕하고 나온 아리영을 남편은 느닷없이 껴안고 보료 위에쓰러뜨렸다.가운만 걸친 아리영의 알몸이 거침없이 드러났다.
연붉은 석류를 비집고 남편이 서둘러 들어선다.
아리영은 고통으로 움찔했다.방금 목욕하고 나온 「육신」은 전혀 윤기를 머금어 있지 않다.
결혼생활 10년인데 어쩌면 이렇게도 여자를 모르랴 싶었다.반발이라도 하듯 거품비누로 씻어낸 콧수염의 감촉이 되살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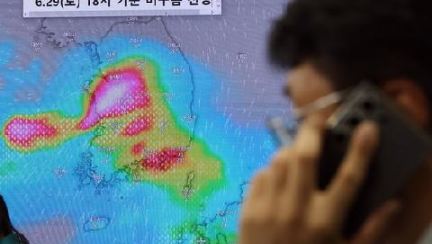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