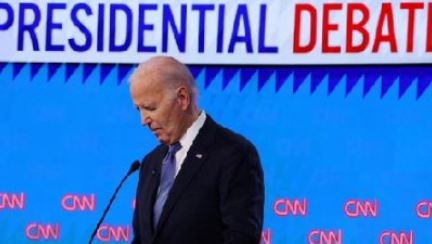교수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질 조짐이다. KAIST가 새 학기 직전 연구실적이 부진한 교수 6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지난해 테뉴어(정년 보장) 신청 교수 15명을 탈락시킨 데 이어서다. 성균관대도 교수 3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한양대는 재임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교수 8명에게 3년 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최종 탈락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서울대는 정년 보장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자질이 부족한 교수는 걸러내겠다는 전례 없는 조치들이다.
그간 교수 사회는 경쟁 무풍지대였다. 재임용이나 정년 보장 심사가 형식적이다 보니 쉽게 정년이 보장되는 시스템 속에 안주해 왔다. 교수 사회가 ‘철밥통’ 소리를 들어온 이유다. 이러니 경쟁이 있을 리 없고 연구업적이 제대로 나올 리 없다. 경쟁 상대인 선진국 대학은 어떤가. 한동대 초청으로 방한한 해리 루이스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어제 “하버드대도 테뉴어 심사에서 교수 절반이 떨어진다”고 소개했다. 재직연수가 찼다고 자동으로 정년을 보장받는 건 미국 대학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다.
대학 경쟁력의 핵심은 교수다. 노력하지 않는 교수는 대학에서 나가는 게 맞다. 교수 사회의 철밥통 관행을 깨야 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KAIST를 진원지로 하는 교수 개혁 바람은 고무적이다. 다만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선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재임용 심사기준이 엄정해야 한다. 평가 잣대와 절차가 공정해야 반발이 없다. 탈락 교수들이 다른 대학이나 직업을 찾아 재기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도 뒷받침돼야 한다. 무조건 무능 교수로 낙인찍어 도태시켜선 재임용 탈락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대학도 교수 탓만 해선 안 된다. 교수들이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다. 그럴 능력이 없는 대학은 교수 개혁에 앞서 대학 자체의 존폐를 고민하는 게 순서다. 대학도 이젠 퇴출 예외지역이어선 안 된다. 한국 교수 사회 전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다.



![[단독] NASA 출신 새 기상청장 "100년만의 폭우, 이젠 30년에 한번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1/9f34ae5b-1267-4749-98b8-fce61d535466.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