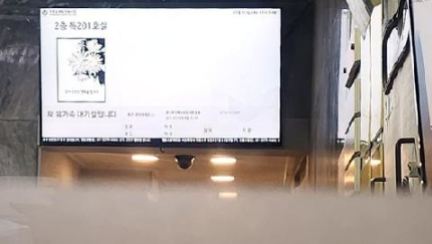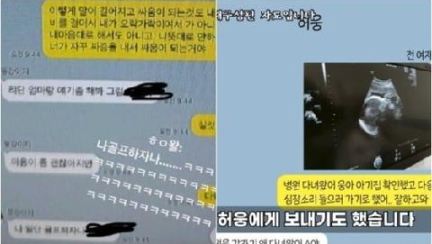김신일 교육부총리가 현 정권 임기 20일을 남기고 교육 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데 대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한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17개월 동안 ‘대통령 코드 맞추기’의 전형을 보여줬다. 그런 그가 임기 말 로스쿨을 둘러싼 청와대와 교육부의 충돌 과정에서 ‘반짝 항명’을 했다. 그래서 물러난다는 게 사퇴의 변이다. 말은 그럴 듯하다. 하지만 그게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인지는 의문이다.
김 부총리는 소신을 바꾼 공직자로 꼽힌다. 교수 시절부터 취임 전까지 그는 자율주의자로 평가됐다. 임명 당시 여권에서 그의 자율·수월성 중시 교육관을 문제삼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재임 중 자율과는 거꾸로 가는 현 정부의 임기 말 ‘교육 역주행’ 정책에 앞장섰다. 대입에 학생부 반영비율을 강제하고 특목고 억제 정책에 앞장섰다. 차기 정부에서 뒤바뀔 게 뻔한 교육정책을 임기 말까지 밀어붙인 현 정권의 오기는 교육현장의 혼선을 부추길 수밖에 없었다. 그 한가운데 김 부총리가 있었다.
물론 장관이 소신만으로 청와대의 담을 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릇된 방향이라고 판단될 땐 자리를 걸고 바로잡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라고 식견과 역량이 있는 인사를 뽑아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겠는가. 교육부 장관이라면 교육적 판단이나 국가 교육력 제고와 무관한 정치성 정책을 설득을 통해 소신껏 걸러냈어야 했다. 이번 로스쿨 문제로 청와대와 충돌한 것은 그동안의 처신과는 대조적이었다.
김 부총리의 사퇴는 새 정부엔 반면교사(反面敎師)다. 청와대와 새 정부 교육부 장관은 공직자의 소신과 자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수위가 짜놓은 새 정부 교육정책 틀은 꽤나 구체적이다. 그 틀을 주도한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청와대 수석으로 내정된 상태다. 교육부 장관의 운신 폭이 좁아질 공산이 크다. 제2의 김 부총리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기에 더 소신과 설득 역량을 갖춘 교육 수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