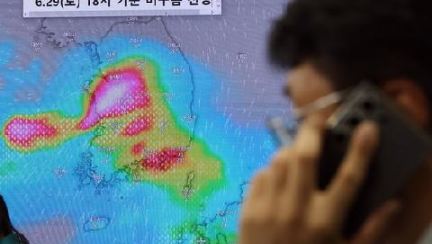2부 '비누'에서는 "비누는 배추가 아니다 그러나 가을 아침 햇살에 젖는 비누는 푸른 배추 배추밭에 바람 불고 배추가 피를 흘린다"고 노래한다. 요령부득이다. 3부의 '비누'에서 궁금증이 좀 풀린다.
"비누를 보면 보는 것이고 만지면 만지는 것 손을 씻으면 손을 씻는 것 발을 씻으면 발을 씻는 것이다 무슨 말이 필요하라?""비누의 길이 삶의 길 비누와 함께 비누를 따라 비누 속에 살자! 비누는 매일 사라진다"
비누라는 대상은 나의 의도에 따라 여러가지로 활용될 수 있고, 그 쓰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비누의 길은 삶의 길, 비누는 매일 사라진다고 했으니 삶은 비누거품처럼 매일 사라지는 어떤 것일 게다.
그럼 1부의 '비누'를 '삶은 마루에 있고 거실에도 있다'고 읽을 수 있을까? 2부의 '비누'는 여전히 난해하다.
이씨는 '대상을 지워버린 시기→'나'라는 자아를 지워버린 시기→언어를 지워버린 시기'로 변천해온 시력을 소개했다. 이번 시집은 2년 전부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언어와 지시 대상이 자의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주장은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씨는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는 불교적인 맥락으로도 '비누'를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언어와 대상 사이의 끈을 끊어버리면 비누가 가랑비나 젖은 배추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씨는 "시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야 하는가, 결과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시 쓰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번 시집에서는 비슷한 시들끼리 분류하고 순서를 배열하는 구성조차 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