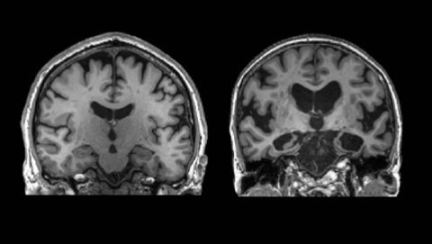'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 골목에서 분신 자살하기 7년 전인 1963년, 열다섯살의 그는 대구에 살고 있었다. 그가 남긴 표현대로 '하루가 돌아온다는 것이 무서운' 삶이 계속되던 시절, 신문팔이.구두닦이를 하면서 청옥고등공민학교를 잠시 다닌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그에게 공민(公民)학교는 학업을 이어줄 거의 유일한 창구였다. 하지만 숙명 같은 가난은 그를 다시 청계천 노동자로 내몬다.
지금은 문맹률(文盲率)이 낮지만(12세 총인구의 1% 미만 추정) 해방 직후 상황은 달랐다. 78%에 달한 것이다. 민주주의 이식을 위해 무엇보다 문맹 퇴치가 필요하다고 여긴 미 군정은 46년 공민학교를 설치했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들에게 단기간(1~3년)에 그 과정을 밟게 한다는 취지였다. 48년 정부 수립 후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고등공민학교도 생겨났다.
공민과 시민의 개념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시민은 '국가에서의 자유'를 지향하지만 공민은 '국가에 참여할 권리'에 더 무게를 둔다. 돈이 없어 제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교육 참여의 기회를 주자는 공민 철학에서 이 학교는 출발한 것이다. 50년대 서울의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는 50여개씩에 이를 정도로 번성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59년)되고 학생이 줄어들면서 공민학교는 70년대, 고등공민학교는 90년대 각각 한자릿수로 줄어든다.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은 고등공민학교의 몰락을 재촉한다.
얼마 전 서울에 하나뿐인 고등공민학교가 마지막 졸업식을 했다. 수도고등공민학교가 개교한 지 50년 만에 문을 닫은 것이다. 수지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학교를 꾸려온 유수열(劉秀烈)이사장 겸 교장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제 서울에는 공민이란 이름으론 기청공민학교만 남게 됐다. 아직 글을 깨우치지 못한 할아버지.할머니, 여러 이유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공민학교는 사라져도 이들의 교육 기회만은 줄어들어선 안 된다.
대졸자 다섯명 중 한명이 실업자라는 '이태백' 시절이다. 배울 것 다 배우고도 놀고 있는 청년들은 교육 소외계층의 상징이자 희망이던 공민학교를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이규연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