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불타는 바다 땅끝에 선 사람들(25)『아니 어떻게 그걸 다….』 『뭐 그렇게 넓은 섬이라구.그런 소문이야 금방이지.손바닥 같은데.』 명국이 다쳐서 다리를 잘랐다는 것까지 알고있었다는데 길남은 조금 놀란다.같은 핏줄이어선가,그래도 같은 조선사람들이어선가.
그런 소식이라도 챙겨 듣고 있었다는 화순이 갑자기 고맙고 어쩐지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옷소매에서 화순이 담배를 꺼냈다.몸을 수그리며 몇 번 성냥을 그었지만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성냥불은 이내 꺼지고 말았다.
길남이 바람을 막아서며 그녀에게 몸을 구부렸다.성냥을 긋느라몸을 숙인 그녀의 목덜미가 저녁빛 속에서도 희디 희다.담배를 붙인 그녀가 몸을 세웠을 때 길남은 이제까지 그 어디에서도 맡아보지 못했던 여자의 냄새를 그녀에게서 맡았다.
화순이에게서 풍겨오는 화장냄새였다.그 냄새에 취한 듯 갑자기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뭔가 못된 짓이라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길남은 그런 자신에게 놀라면서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바다를 향해 몸을 돌렸다.
화순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어떻게 됐어? 좀 나았나?』 『많이 좋아졌어요.사실은,바로 그 얘기 때문인데,한번 아저씰 보러 와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화순이 콧소리를 내며 웃었다.
『한번 가 보지 않을래요? 아저씨가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생각했거든요.』 희미한 어둠 속으로 화순이 그 어둠보다 조금 더어둡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갈 데가 따로 있지.거기가 어디라고 가겠어.그리고,나그 사람 잘 몰라.그냥 이렇게 나왔다가 만나 이야기나 하고 그래서 서로 얼굴이나 아는 사이지.』 담배연기 때문인가.그때 화순이 몹시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다.가슴을 움켜쥐듯 하며 몸을 구부리고 기침을 해대던 화순이 담배를 발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방파제 끝 쪽으로 가 쭈그리고 앉았다.기침이 멎는가 하자 토하는지 어깨를 출렁거리며 화순이 욱욱 소리를 냈다.
길남이 다가가 그녀의 뒤에 섰다.토하려고 해도 구역질 뿐 토해지지가 않는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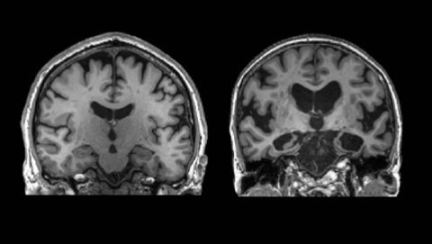


![[오늘의 운세] 7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