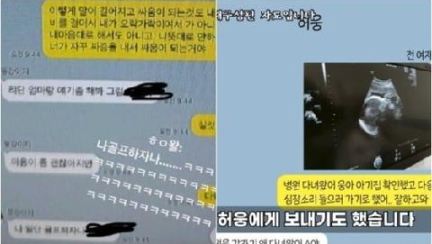낙동강 수질오염사건으로 온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면서 생수와 정수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약수터에선 물을 받아가려는 인파가 철야로 장사진을 이룬다. 이러한 현상이 영남지방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비단 낙동강뿐만 아니라 전국의 하천수질이 심한 오염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생수의 품질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시판 생수의 일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인 제조과정을 거친 「생수」가 아니며 단순한 광천수거나 계곡물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누구나 갖고 있다. 다만 적어도 악취가 나지 않고,중금속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다. 간혹 소비자단체가 실시하는 수질검사에서는 시판생수 중에 세균이 기준이상 검출되기도 하고,약수터의 물도 20% 가량은 세균이나 중금속에 오염돼 있다.
외국에서 통용되는 생수란 지하암반층 밑에서 채수한 물을 여러 여러과정과 자외선 살균처리를 거친후 살균된 병에 담고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광천수를 정수처리해 음용에 적합하게 제조한 물」이라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막연한 규정만 있을뿐 수질기준 하나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다. 그나마 주한 외국인용이나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모두가 불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국인에게 파는 생수는 전체 판매량의 3∼4%에 불과하고 절대량이 내국인에게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그 시장규모가 무려 1천억원에 육박한다.
현실이 그러한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생수시판의 허용을 유보하고 있다. 지난 76년부터 시작된 생수정책은 20년 가까이 시판금지→허용→금지를 10여차례 우왕좌왕하면서 아직도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사회소득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이유다. 정부의 생수정책이 갈팡질팡하는 사이에도 국민의 생수수요는 계속 증가해 이제는 정식 허가업체보다 무허가 업체의 생수가 더 많이 유통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생수정책은 마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면서 태양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꼴이다. 물론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공급이 정부의 최우선적인 책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수의 유통을 불법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시판생수의 위생상태와 품질이 어느 누구의 통제나 감시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생수시판을 현실화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는게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