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세 사람의 위세는 대단했다. 무력이 빼어나 일국의 군왕인 경공마저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자연스레 이들의 태도는 조정에서 안하무인이었다. 임금을 위기에서 구해낸 공로로 이름을 떨쳤지만 위세가 도를 넘어 안팎의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골칫덩어리로 변한 것이다.
안영은 당시 재상이었다. 그는 공자나 맹자 등 성현에게나 붙는 자(子)라는 호칭이 따를 만큼 지혜의 대명사다. 그 역시 재상이 지나가도 일어나거나 예를 표할 줄 모르는 삼총사가 마음에 걸렸다.
경공의 묵인 아래 그는 이 삼총사를 제거하기로 한다. 경공은 안영의 계획대로 술자리가 열린 어느 날 정원에서 가장 좋은 복숭아를 다섯 개 따오도록 한다. 경공과 제를 방문한 초나라 왕이 하나씩을 먹고, 안영은 초나라와의 외교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공로에서 역시 복숭아 하나를 얻는다. 문제는 나머지 두 개.
삼총사는 복숭아를 탐낸다. 먼저 전개강이 나서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며 복숭아 하나를 차지한다. 이어 고야자도 임금을 위해 이무기를 베어 버린 공을 내세우며 복숭아를 집어 든다. “내 복숭아…?” 나머지 한 사람 공손접은 화를 참지 못한다.
일개 무부(武夫)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공손접은 복숭아 두 개에 담겨 있는 안영의 꾀를 읽지 못한다. 성질 급한 공손접은 “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다니 억울하다”며 검을 빼어 들어 자살한다. 나머지 두 용사도 역시 복숭아에 눈이 어두웠다며 자결하고 만다. 두 개의 복숭아로 세 명의 용사를 죽였다는 내용의 ‘이도살삼사(二桃殺三士)’의 고사다.
가뭄에 콩 나듯이 언뜻 화해 국면을 보이다가도 늘 그악스러운 다툼으로 접어드는 한나라당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다. 대통령 자리와 집권당이라는 두 개의 복숭아가 그렇게 탐이 났는지 내투가 그칠 날 없다. 대국을 살필 줄 모르는 우매함은 힘 쓰는 것밖에 모르는 무부와 다를 것이 없다. 실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은 자신의 ‘공로’에 눈이 어두워진 모양이다. 민심은 마치 복숭아 두 개를 건네는 경공의 마음처럼 이미 한나라당에서 저만치 멀어져 가는 것도 모르는 채 말이다.
유광종 국제부문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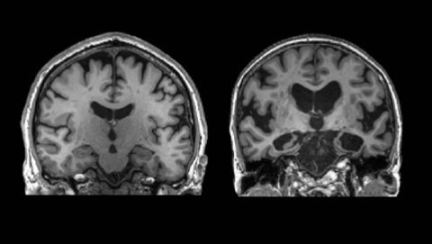


![[오늘의 운세] 7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