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주 비가렐로 지음, 정재곤 옮김, 돌베게, 344쪽, 1만5000원
역사는 정치나 경제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그날그날 먹고 입고 자는 보통사람들의 생활도 역사학의 훌륭한 연구 대상이다. 이를 생활사라고 한다. 역사를 일종의 골동품 다루듯 탐구하는 분야다.
이 책은 그 중에서 청결의 역사를 주제로 삼는다. 특히 중세 이후의 서양의 위생관과 이를 둘러싼 생활 습속의 변천을 다루고 있다.
책 전반에 걸쳐 목욕과 관련한 관습이 많이 나온다. 16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목욕탕은 매춘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장소였다고 한다. 지은이는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마치 그런 목욕탕을 가보기라도 한 듯 생생하게 묘사한다. 목욕탕에 이어 화장실이나 비데, 상하수도가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 현대식으로 발전해왔는지 상세하게 기술한다. 또 청결을 지키기 위한 내의, 불결을 덮기 위한 향수에 관한 설명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렇다고 술술 읽어 내려갈만한 책은 아니다. 의외로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표현이 많다.
가벼운 소재들에 일일이 묵직한 문명사적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그렇게 된 듯 하다.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기술 변천사가 더 궁금한 독자들에겐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가끔은 자의적 해석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다. 예컨대 18세기 귀족층은 사치ㆍ세련ㆍ여유를 보여주는 온욕을 즐긴 반면, 새로이 부상한 부르주아들은 신체를 단련시키는 냉욕을 선호했다는 대목이 그렇다. 과연 당시의 목욕물의 온도에 사치와 검소, 관능과 금욕, 나약함과 활력, 인위와 자연의 대립과 같은 깊은 뜻이 담겨 있었을까.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이 많아 얘깃거리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는 그만이다. 다만 역사 서적에서 늘 무슨 메시지를 찾으려는 독자라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프랑스 파리5대학의 사회역사학 교수인 지은이는 서양 생활사 연구에 독보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원저는 프랑스에서 출간된 지 22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남윤호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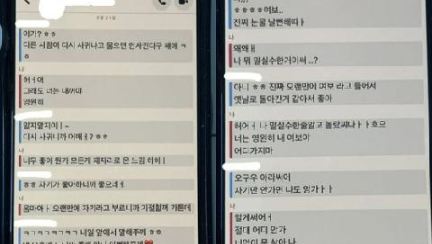
!["형, 이럴려고 5선 했어?"…86 푸시에도 불출마 기운 이인영, 왜 [who&why]](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6a0e5eaf-34f9-4b83-8805-da9884f9957c.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