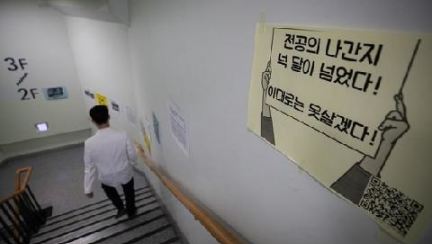부동산 거품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0년 들어 IT거품이 사라지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IT거품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수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그 결과 과잉공급된 유동성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신흥국의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 왔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미 미국.영국.호주.중국의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과잉공급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가는 현상은 우리나라도 같지만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하거나 넘치는 국내 유동성을 무작정 해외투자로 돌리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부동산 거품 대책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취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던 1980년대 미국은 수신금리 인하 등을 통해 시중자금을 뮤추얼펀드나 단기투자신탁으로 유도해 주식 및 채권시장을 회복시키고 부동산 거품이 재연되는 것을 막았다. 부동산을 대체할 매력적인 자금운용 수단으로서 주식과 채권의 위상을 확립한 것이다. 당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품이 재발하지 않은 것은 전통산업이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기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자본시장이 과열되면서 헤지펀드 같은 금융 투기세력과 불로소득자가 대거 등장, 전통산업과 중산소득층이 위축되고 찰나주의와 경제양극화가 확산된 것은 문제였다.
1990년대 일본은 갑작스러운 금리인상으로 부동산과 주식 거품이 동시에 붕괴, 금융회사와 기업 모두에 타격을 주고 장기불황에 진입했다. 당시 부동산담보대출과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컸던 일본의 은행에 금리인상이 미칠 부정적 영향은 이미 예상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거의 모든 산업이 활황 국면에 놓여 있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식을 기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이미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대량 투자해 거액의 환차손을 떠안고 있었던 은행과 기업에 이중 비용으로 작용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는 금리인상 대신 LTV-DTI 규제를 택한 것이다.
일본 사례에서 보듯 거품은 생성보다 붕괴 과정에 부작용이 많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불황 국면에서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있어 실물산업이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은 일본처럼 부동산담보대출 및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커 거품이 꺼지면 대출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고 유가증권 평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LTV-DTI 규제를 양대 축으로 부동산 투기에 쐐기를 박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늦었지만 현명한 결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의 취지가 부동산시장 및 경제의 연착륙(soft-landing)에 있음을 감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빈대(투기적 수요자)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실수요자 및 경기)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금융정책·제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