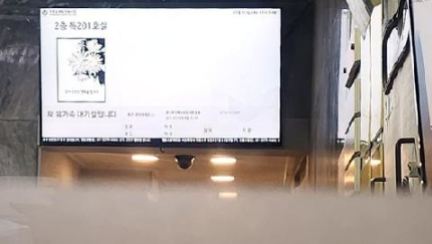차준홍 기자
실물경기 불안한데 재정·통화정책 대응 여력은 줄어
낡은 세제는 합리화하되 전체적 세수 감소는 없어야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경제 위험의 파고가 높아질 때마다 흔들리기 십상이다.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파를 견디고 감내하려면 나라 재정이 탄탄해야 한다. 그래서 건전재정을 나라 경제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나라 곳간은 괜찮은가. 요즘 발표되는 재정 통계 숫자는 지켜보기 불안하다. 5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통 크게 뿌려댄 문재인 정부 때도 아닌데 그렇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 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올해도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낼 것 같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전년 동기보다 9조1000억원이나 적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잘 걷히지 않는 탓이다. 올해 결손 규모는 10조원대로 추정되고, 하반기 세수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20조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세수 부족 규모가 커지면 추경으로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다른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현 정부로선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대규모 불용(不用) 예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건이 달라져 쓰지 않은 예산은 괜찮지만, 써야 하는데 여력이 안 돼 불용이 됐다면 문제다. 불황을 더 심각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을 승인한 국회의 권한을 편법으로 침해할 수도 있어서다. 정부는 의도적인 불용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선 안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즘 실물경제 지표마저 좋지 않다. 최근 발표된 5월 산업활동 동향에는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가 10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다. 정부 기대처럼 경기 회복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경기 흐름이 나쁘면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푸는 게 교과서적 대응인데, 우리는 이도 저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와 외환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고, 재정 결손이 커지면 정부의 정책 대응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통화정책이 모두 묶이는 셈이다. 정부의 희망처럼 내수 회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아직 바닥을 찍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정 결손은 불황의 골을 더 깊게 하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와중에 정부와 정치권은 감세 드라이브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정부는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약속했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까지 담을 예정이다.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세제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인 세수 감소가 없도록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재정이 허약한 나라의 국채를 팔아치우고 공격하는 투기 세력을 일컫는 ‘글로벌 채권 자경단(自警團)’은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는 나라, 정책 신뢰를 잃은 정부, 포퓰리즘 감세에 의존하는 나라를 호시탐탐 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