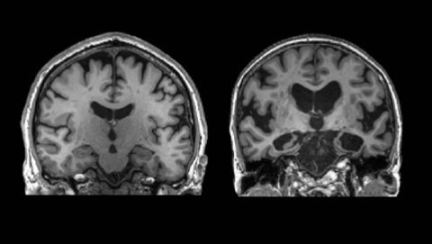이라크 파병을 놓고 오가는 말 가운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 있다. 명분없는 전쟁을 벌인 미국을 도와 파병할 경우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때 막을 길이 없다는 얘기다.
언뜻 들어 그럴 듯하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마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된다 해도)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보통 사람들 생각이다. 또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북한에 무력을 행사할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주장에는 미국의 대북 무력행사를 막을 확실한 억지장치는 바로 한국이란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도 한.미 간에 탄탄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다. 벌써 잊었는가.
1994년 봄 소위 1차 북핵위기 당시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 게 미국이다. 아니 한.미 동맹관계가 그 정도밖에 되질 못했다. 신뢰가 깨지고 나면 동맹은 허울뿐이다.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화가 중요하다면 저 멀리 이라크의 안정도 외면해선 안 된다. 또 한반도의 평화를 중시한다면 마땅히 미국이란 동맹의 의미도 새겨봐야 한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공짜란 없다. 이래저래 부시 정부는 세계 도처에서 인기없는 정권이다. 하지만 부시 정부와 미국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부시와는 별개로 미국이라는 동맹국의 전략적 필요성은 따져봐야 한다.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은 북한이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주변을 위협하는 상대와 공생하기 위해 미국이란 동맹이 필요하다. 좀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북한이 미국을 애타게 찾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국은 필요하다.
그런데 바로 그런 미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문제에까지 미국을 도와선 안 된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이처럼 신뢰에 흠집이 가기 시작하면 국가 간의 관계도 꼬일 수밖에 없다.
며칠 전 뉴욕 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가 북핵 관련 기사를 쓰면서 지난달 한.미 외무장관 간의 만남을 소개했다. 북핵 처리에 미 정부가 좀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줘야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란 얘기였다.
미국의 파월 장관과 측근들은 우리 측의 논리에 기분이 몹시 언짢았던 모양이다. 지난주 내가 워싱턴에 머물고 있을 때 만난 미국 친구들 여러 명이 같은 얘길 전했다. 우리 정부는 부인했지만 정말 당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해 정작 무얼 그르쳤는지 모른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설혹 사실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곤 말하지 않겠다.
문제는 다름아닌 신뢰다. 당시 파월 장관은 시쳇말로 "한국이 정말 우리의 동맹 맞아?"라고 느꼈던 모양이다. 그런데 정말 미국이 북한 다루기에 있어 한국의 고민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또 미국에 북한문제를 믿고 맡겨둘 정도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 파월의 그런 반응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반세기 동맹관계의 현주소가 대충 이런 지경에 와 있다.
이라크 파병 결정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일로 다가왔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까지 통과됐으니 미국의 전쟁 뒤치다꺼리가 아니라 유엔의 권유에 따라 이라크 주민의 안위를 돕기 위한 파병이란 설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으로 멍든 한.미 관계가 금방 치유될 것으로 본다면 지나친 기대다. 그만큼 양국 간 신뢰는 상처받았다. 이라크 파병은 참담한 지경에 이른 양국 관계를 추스르는 시작의 의미도 크다.
길정우 통일문화연구소장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