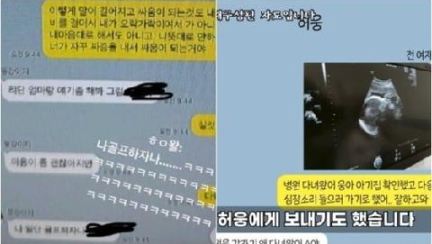"제약회사 직원의 촌지 공세나 향응 제공은 관례화한 일이었습니다. 현금이 든 봉투는 물론 수백만원대의 디지털카메라를 받고 처방약을 바꾸는 사례도 있었지요. " (가정의학과 개원의 J씨)
"종합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처방의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병원 고위층이나 과장의 지시에 의해 약값 마진이 높은 특정 복사 약품을 기계적으로 처방해왔을 뿐이지요. 또 경영진 요망에 따라 환자들에게 최대한 입원을 유도했습니다." (K병원 내과 전문의 L씨)
의사들은 의약분업 전 랜딩비와 리베이트비 등 약품을 둘러싼 음성소득이 컸음을 대부분 인정했다.
최근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와 의약분업 실시로 약가를 둘러싼 거품이 거의 소멸된 때문이다.약 판매 마진의 소멸은 특히 동네의원에 치명타를 가했다. 고가 장비를 동원한 비(非) 보험 검사가 어려울 뿐더러 입원실을 갖춘 종합병원과 달리 의약분업에서 예외인 입원환자를 거의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을 해도 처방료 인상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처럼 내과나 소아과.가정의학과 등 진찰 위주의 진료과목은 절반 이상 수익이 감소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 (내과 개원의 Y씨)
"동네의원이 살 길은 오직 환자를 많이 보는 것뿐입니다. 1주일에 한번 방문이면 충분한 비염환자도 매일 오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불필요한 검사인줄 알지만 4만~5만원이라도 벌기 위해 보험이 되지 않는 초음파검사를 하자고 말할 땐 낯뜨겁기 짝이 없습니다. " (내과 개원의 K씨)
젊은 의사들은 더욱 열악한 사정을 호소한다. 3년째 S대병원에서 무급 전임의를 하고 있는 K씨는 "매달 교수들의 연구비를 쪼개 받는 50만원이 수입의 전부" 라며 "전문의를 딴 지 3년이 됐는데도 생계를 위해 부모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자신이 부끄럽다" 고 털어놨다.
K씨는 "그래도 의사들은 잘 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양심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의사들이 잘 산다는 사실 자체가 비극입니다. 편법 진료가 판을 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라며 씁쓸해했다.
![[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