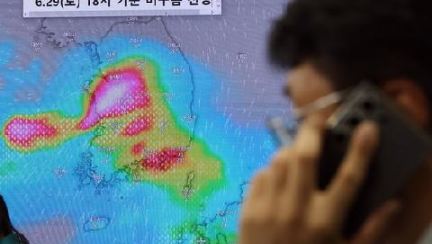여섯 젊은이의 목숨을 빼앗고 10여명에게 사경의 고통을 안긴 부산 동의대사태는 갈 때까지 간 우리의 시위문화 수준을 이제야 깨닫게 해준 교훈이었다.
마치 철천지원수처럼 양보 없는 과격, 대안 없는 대립으로 치달아온 시위-진압의 악순환 끝에 기어이 저질러진 중대한 범죄사건이었다.
3일 밤 희생자들의 빈소가 차려진 부산백병원과 시립병원 영안실에는 「오늘의 한국경찰」이라는 죄 때문에 「억울하게」숨져간 이들의 가족·친지·동료경찰들이 밤새 통곡과 함께 비통의 몸부림을 쳤다.
『모두 죽여야해. 총살로….』숨진 전경의 동생인 듯한 꼬마소년이 주먹을 움켜쥔 채 앙칼지게 외치다 쓰러져 흐느꼈고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노모와 부인네들도 속속 실신했다.
『신나가 질펀한 컴컴한 계단을 통해 7층 철문을 부수고 들어갔죠. 코앞 신나통에 불붙인 막대기가 꽂힌 게 보였어요.』
『그때 이미 우린 화공의 표적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고 순식간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검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였죠.』
응급실과 중환자실 곳곳에선 숯덩이처럼 된 얼굴을 찌그리며 아비규환의 처절했던 상황을 얘기하는 젊은 전경들의 목소리가 숨소리처럼 가냘프다.
방향도, 감각도,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밀폐된 방안에서 우왕좌왕 탈출구를 더듬던 이들은 헬멧과 방독면이 불길에 녹아 내리는 고통 속에서 숨져가거나 창을 깨고 20여m아래로 뛰어내렸다.
「이틀전 총기를 난사한 파출소의 과잉공격이 부른 비극」「평소 무자비한 폭력·살인 경찰」이라는 학생들의 반성을 모르는 변명도 『차라리 죽고 싶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부상자들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 듯 들렸다.
허술한 작전계획 아래 무리하게 이들을 농성장으로 들여보낸 간부들의 오만도….
격무와 질책, 숱한 눈총 속에서 치러진 이들의 희생이 「폭력추방」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부산=김석현 기자>
![美대선 첫 토론 끝나자마자…'바이든 후보 교체론' 터져나왔다 [미 대선 첫 TV토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2d3c4b71-8167-498f-bf6b-64eba3f58689.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