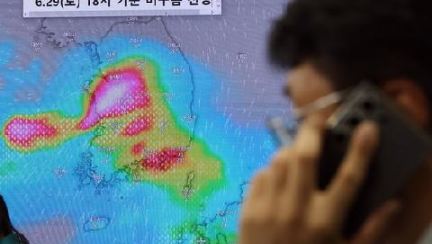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48)씨가 전부인 이모(47)씨의 연락처 및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심부름센터(일명 흥신소)’를 이용했다고 유가족이 진술하면서 흥신소의 불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서구 전처 살인 피의자도 이용 #불법에도 처벌 약하고 단속 외면 #“공인탐정제도 빨리 자리잡아야”
4일 온라인에서 광고 중인 일부 흥신소에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며 명의자 이름과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의뢰한 결과, 업체들은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다”며 건당 50만~80만원의 비용을 요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일명 ‘조회업자’로 불리는 통신업자들과 뒷거래를 하면서 의뢰인들이 보낸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이름과 연락처, 고지서 주소 등을 조회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장조사의 경우 보통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전했다. 의뢰된 차량에 위치파악정보시스템(GPS)을 부착해 동선을 파악해주거나, 미행을 통해 일상생활 사진을 찍어 제공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복제해 일명 ‘쌍둥이폰’을 제작해 준다는 업체도 있었다. 스마트폰 명의자의 통화, 메시지, 사진, 결제 등의 모든 행위를 실시간으로 그대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가 아닐 경우 개인의 연락처 및 소재를 알아내는 것은 불법이며, 이동성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모두 처벌된다.
이런 불법 흥신소 행위에 대해 경찰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 때만 반짝 사라질 뿐이고 설사 적발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은 “대학 및 대학원에서도 탐정학과가 생기는 등 공인탐정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 조사행위에 대해 인정해주되 불법흥신소에 대한 단속·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인탐정제도가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서 전처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2년 전 김씨가 저지른 흉기 협박 혐의에 대해 ‘뒷북 적용’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 1월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에서 김씨가 모녀와 마주쳤을 당시 흉기를 보여주며 전 아내를 협박했지만 경찰이 흉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특수협박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의 여죄를 캐는 과정에서 유족의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112 신고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근무일지에도 흉기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2년이 훌쩍 넘은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당시 김씨가 제대로 범행에 대해 처벌받았다면 이번 살인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美대선 첫 토론 끝나자마자…'바이든 후보 교체론' 터져나왔다 [미 대선 첫 TV토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2d3c4b71-8167-498f-bf6b-64eba3f58689.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