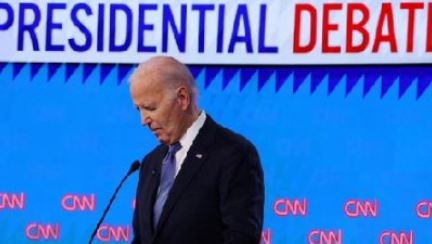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운영 중인 공익재단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공익재단이 교육·문화·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에는 뒷전이고 재벌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을 지배하는 데 편법 동원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공정위가 지난 24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담겼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앞으로 이들이 보유한 대기업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주주가 경영에 대한 의사를 표현할 권리)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재계는 이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 명분 #지분 3% 안돼 영향력 없는 곳 태반 #“주식 의결권 제한 땐 위헌 소지도”
재계는 “공익재단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공정위 논리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공정위가 24일 공개한 ‘공익재단 출자현황’ 자료를 분석하면, 대기업 계열사 122개 중 공익재단이 보유한 지분율이 3%가 채 안 돼 지배력 행사가 어려운 곳이 58.2%(71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공익재단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계열사는 16개로 분석 대상 기업의 13.1%이지만, 대부분 청소·구내 식당·통근 버스 등 용역 자회사이거나 핵심 사업과는 거리가 먼 회사들이란 설명도 덧붙인다.
재계는 또 공정위 시각이 1990년대 이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공익재단에 계열사 지분을 넘겨주면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재벌 2세에게 지분을 물려줄 수 있었다. 그러나 93년 정부는 공익재단이 5% 이상 보유한 특정 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렸다. 기업 입장에선 5% 이상 지분을 공익재단에 기부해도 세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지다 보니,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공익재단을 이용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최근에는 지주회사가 경영권 승계의 도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공정위의 ‘공익재단 출자현황’에서 공익재단이 세제 혜택 한도인 5%까지만 지분을 보유한 곳이 70.5%에 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란 것이다.
규제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공익재단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모두 제한하더라도, 대부분 지분율이 낮은 탓에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 등 최대주주의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공익재단 지분율이 10% 이상인 계열사들도 총수 경영권과는 거리가 먼 비핵심 계열사들이다. 이번 개정안이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막겠다는 규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재계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익재단이 부당 내부거래에 동원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 행태가 드러나면 관계 당국이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주식의 의결권 자체를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의 의결권은 일종의 사유재산권으로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 소지도 있다”며 “이번 규제로 기업 기부 활동만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단독] NASA 출신 새 기상청장 "100년만의 폭우, 이젠 30년에 한번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1/9f34ae5b-1267-4749-98b8-fce61d535466.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