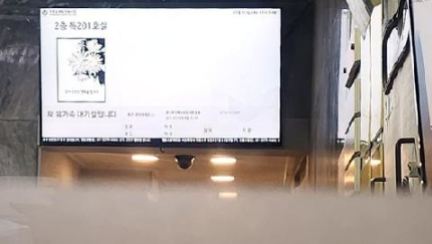"'노 프러블럼(No problem)'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인도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한국 기업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한다.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No problem'은 "문제 없다"는 합의의 뜻이 아니라 "당신 말을 이해했다"는 수준의 의사 표시라는 것. 계약을 성사에 급급해 이 말만 믿고 돌아왔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KOTRA는 이처럼 인도에 진출했다가 부닥칠 수 있는 애로 사항을 모아 열가지로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표 참조>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인도에는 82개 한국업체가 진출해 140여건의 투자가 이뤄졌다. 투자 규모는 5억8000여만 달러(약 5800억원) 정도다.
◆열악한 인프라를 고려해야=K가전업체는 물류 비용이 예측보다 훨씬 많이 들어서 최근 사업을 접었다. 거점 판매가 어려워 추가 마케팅.물류 비용이 감당 못할 정도로 늘었다. 도로는 척박하고 땅은 넓다는 점을 투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또 인도의 많은 지역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정전이 된다. 한국에서처럼 공장을 돌릴 수 있다고 예측해선 안 된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악조건을 고려한 현지 적응형 세탁기를 개발해 재미를 보기도 했다. 정전으로 전원이 꺼졌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작동이 멈춘 이후의 과정을 계속하는 기능을 달았더니 판매가 급증했다.
◆"인구의 20%만 잡아도 2억명인데…"=인구가 많다고 시장을 막연히 크게 봐서는 안된다. 상품 구매력을 따져봐야 한다. 인도 국가경제연구소(NCAER)가 중산층이라고 밝힌 약 3억명. 그러나 이들의 연간 소득은 4500여달러(약 450만원)에서 2만3000달러(약2300만원) 수준이다. KOTRA에 따르면 한국 기준의 중산층은 5000만명 정도다.
◆중국과는 다른 시장=인도는 정치적으로 다원화돼 있고 서구식 합리주의 성향이 강하다. 중국에서 성공한 전략이 그대로 먹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KOTRA 해외조사팀 이해인씨는"인도인들이 토착 기업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품질보다 가격에 민감한 점 등을 고려해 색다른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그러나 인도 시장은 여전히 해외 투자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다. 연구개발(R&D) 인력이 풍부하고 영어가 잘 통해 지식기반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내수 시장이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저임 노동력도 풍부하다는 점도 매력이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