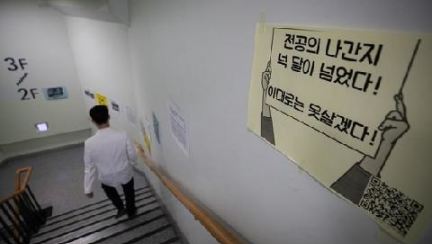80년대도 서서히 종반을 향해 기울고 있다. 80년대의 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다. 『80년대는 시의 시대』라는 평가가 80년대 초반을 휩쓸었는가 하면 『군소 재능의 혼란기』라는 비판도 역시 대두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80년대엔 무수한 시인들과 동인지와 시집들이 쏟아져 나왔다.
80년대 시단을 누구보다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시인 신경림씨와 문학평론가 김주연씨가 최근「80년대 시와 시인들」에 관해 폭넓은 대담 (『문예중앙』여름호 게재) 을 나눴다. 이들의 대담을 통해 80년대 시단의 물결을 짚어본다.
신씨는 먼저 80년대 들어 문예지나 신춘문예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하지 않고 나온 시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 이 같은 현상의 중요한 계기로「광주사태」를 들었다. 작품화 준비기간이 필요한 소설보다 시 쪽의 반응이 빠르고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신씨는 말했다.
김씨는『80년대 들어 많은 사람들이 시에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제, 『그러나 시작 수련 없이 현실에 대한 의사만 충만하다고 너도나도 시를 쓰겠다고 나서는 풍토는 문제』라고 지적했고 신씨도 이름만 가리면 누구의 시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비슷한 이른바「시인은 많고 시는 적은」상황에는 우려를 함께 했다.
신씨는 노동자시인 박노해·김해화라든가 농촌시인 김용택 등에서 80년대 시의주요특색인 「현장 시」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80년대 시가 종교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피력하면서 김정환·최승호·정호승·김준태·고정희 등의 노력이 폐쇄적 선교주의를 뛰어넘는 문학적 역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80년대 시의 또 다른 특성으로「도시적 서정성」을 꼽았다.
김씨는 특히 서정성의 범위가 기존의 목가적인 것에서 도시적인 것까지 확대된 것은 산업 사회 속에서의 문학기능에 대한 요청적 성과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김씨는 일종의 방관적 자기학대로 보이는 황지우류의 풍자시들은 자칫 우리말을 파괴하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들은 80년대 들어 주목하게된 시인들을 논의했는데 우선 신씨는 최근「굿시」 라는 새 분야를 개척중인 하종오, 농촌적 서정시인 김용택, 지식인문학에 충격을 준 박노해, 그밖에 곽재구·김용락·이산하 시인 등을 거론했다. <기형도 기자>



![[오늘의 운세] 6월 2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