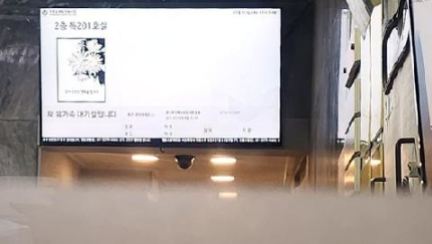미국 재무부가 지난 주말 우리나라를 환율 정책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무역 제재 대상인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될까 우려했던 정부로선 한숨을 돌린 셈이다. 감시 대상국엔 중국·일본·대만·독일도 포함됐다.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는다.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내 조달 시장 진입을 금지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도 가할 수 있다. 외환시장판 수퍼301조로 불리는 ‘베넷·해치·카퍼(BHC)’ 법이 올해 발효됐기 때문이다. 지정 요건은 세 가지다. ①대미 무역 흑자가 많고 ②경상수지 흑자액이 크며 ③환율정책이 한 방향에 쏠려 있는 나라다. 한국은 ①②는 맞지만 ③은 아니라고 판정받아 심층분석국 지정을 간신히 면했다.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믿는다면 순진한 발상이다. 환율은 외교요, 총칼 없는 전쟁이다. 중국·일본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미국은 몇 년 전까지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 외교에 집중했다. 그 결과 미국의 동의 아래 지난해엔 위안화를 국제결제통화로 편입시킬 수 있었다. 아베 총리가 지난 3년간 엔저의 단맛을 즐긴 것도 미국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밀월도 이제 끝나 가고 있다. 지난 주말 일본·중국의 통화 가치는 크게 올랐다. 달러 약세가 본격화하면서 미국발 통화전쟁이 시작되는 조짐이다.
올해는 넘어갔지만 내년도 무사하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이 시범케이스로 손을 본다면 중국·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만만한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대미 환율 외교의 접촉면을 크게 늘려야 한다. 대미 흑자가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서 생긴 ‘불황형 흑자’란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시장과 긴밀히 소통해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참에 우리 수출 기업도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정부의 환율 방패에 기대지 말고 실력에 기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