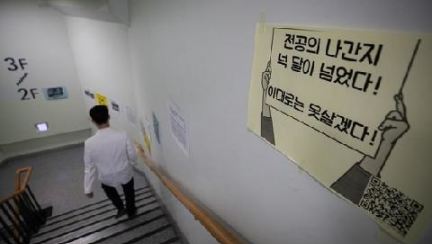고정애
런던특파원
지인의 얘기다. 초등학교 시절 『세계소년소녀위인전집』이란 걸 끼고 살았다.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 편에서 이 한 줄을 발견했다고 한다.
‘에디슨이 미국의 밤을 낮으로 바꾸었다.’
어린 나이였으므로 은유(隱喩)를 알 턱이 없었다. 다만 어찌어찌 하여 우리가 밤일 때 미국이 낮인 걸 알았다. 곧이곧대로 해석한 그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다. “아,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밤낮이 반대구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지인도 마찬가지였다. 잉글랜드 중부 도시인 레스터의 주차장에서 발견된 유골이 사후 529년 만에 리처드 3세의 것으로 확인됐고, 레스터와 잉글랜드 북부 도시인 요크가 서로 안장하겠다고 경쟁한다는 보도를 보곤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다. “당연히 요크.”
리처드 3세가 1400년대 후반 왕권 유혈 경쟁인 ‘장미전쟁’을 벌인 두 가문 중 하나인 요크가(家) 출신이란 걸 알아서다. 요크에서 휘날리던 요크가의 흰 장미가 확신을 더했다. 리처드 3세가 레스터에 묻히게 되자 요상한 결정이라고 여겼다.
오해였다. 요크가는 잉글랜드 남부와 웨일스에서 근거한 왕족이었다. 요크의 누구라고 불린 이가 많았지만 대부분 출생지는 런던이거나 런던 인근이었다. 리처드 3세도 요크 출신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요크가 흰 장미를 내세운 건 18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그만의 일화는 아닐 게다. 우리는 패턴 추구자들이다. 아는 걸 전부라고 여기고 그걸 토대로 가장 개연성 있는 얘기를 만들어내곤 한다. 그 얘기가 그럴싸하면, 또 아귀가 맞으면 진실이라고 믿어버린다.
에디슨을 지구의 자전이란 천문 현상을 뛰어넘는 조물주 반열로 올리는 천진난만함도, 영국 왕가의 근거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바꿔 버리는 무지도 그래서 가능한 법이다.
행동경제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아는 게 없을수록,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조각 숫자가 적을수록 오히려 정합적 이야기를 만들기 쉽다”며 “사실 우리는 이해한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모른다”고 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인지적 불편함을 추구해야 한 다. 즉 의심과 질문이다.
내일이면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한 살 더 먹는다. 어느 정도 이상의 연령에선 세상이 만만해져, 때론 귀찮아져 그저 자신만의 이야기에 안주하고 확신한다. 그 강도가 강해진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 진실에 근접하는 건 아니다. 주변 위 아래로 반면교사가 많다. 새해엔 더 의심하고 질문하자.
고정애 런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