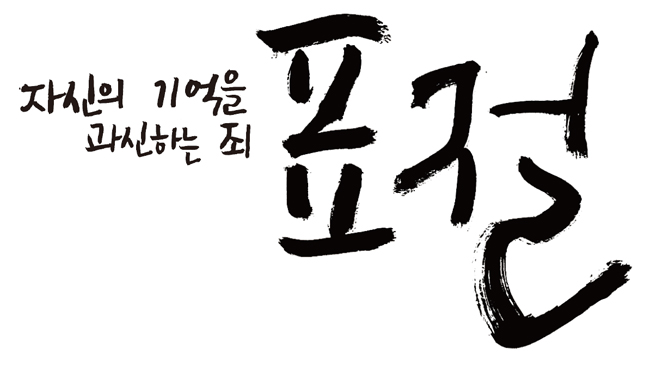
얼마 전에 독자로부터 “표절하셨더군요”라는 제목의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내 기억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게 기억은 ‘썸’의 노랫말처럼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이다. 내 문장 역시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 문장이라는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썸 타는 문장이다.
나는 대략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책을 읽는 것 같다. 읽지 못해도 가방에 책을 넣고 다니며 읽는 시늉이라도 한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권 읽기도 힘든 것 같다. 예전에는 더 많이 읽은 것 같은데. ‘같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기억에 통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읽은 책의 내용을 금세 잊어버린다. 책을 읽었지만 누가 그 책에 대해 물으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 과연 내가 그 책을 읽은 것은 사실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심지어 서점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하고 사서 읽고는 그 책을 꽂아두려고 책장에 갔을 때에야 비로소 이미 샀던 책이란 걸 알게 된 적도 있다. 전에 샀던 책에는 내가 그은 것 같은 밑줄과 내 필체로 보이는 메모가 군데군데 들어있었다.
책을 읽을 때 어떤 문장들에는 밑줄을 긋고 여백에 메모를 남긴다. 어떤 문장들은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쓰다듬기도 한다. 어떤 문장들은 여러 번 읽는다. 읽고 또 읽는다. 리듬이 좋은 문장을 만나면 소리 내어 읽는다. 그렇게 읽으면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생각과 리듬이 마치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지금은 게을러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필사도 꽤 했다.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을 만나면 노트에 옮겨 썼다. 문장뿐 아니라 여러 문단을 옮겨 적기도 했다. 책 한 권을 통째로 필사한 적도 있었다. 그 필사의 흔적으로 오른손 중지에는 아직도 ‘펜혹’이 남아있다. 지금은 필사한 책의 내용도 다 잊고, 필사를 했다는 기억조차 분명치 않지만 오른손 중지의 굳은살만큼은 확실하다.
내가 읽은 책, 여러 번 소리 내어 읽은 문장, 필사한 문단. 그것들은 내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오른손 중지의 굳은살처럼 내 생각과 감성과 문장에 박혔을 것이다. 만일 그것들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나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책을 읽고 밑줄을 긋고 필사를 했겠는가. 수많은 시인과 작가, 사상가, 학자의 생각과 문장들이 내 생각의 호흡 속으로 들어와 숨쉬기를 나는 소망했다. 내가 쓰는 문장마다 그들의 감성과 지성의 숨결이 함께하길 열망했다.
가끔 내가 쓴 문장을 읽다가 놀랄 때가 있다. “새로움은 아름다운 불안이다.” 정말 내가 쓴 문장이 맞는가? 아름답지는 않지만 불안할 정도로 새롭고 낯설다. 오래 전에 쓴 글이라면 썸 타는 기억 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최근에 쓴 글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문장들은 내가 썼지만 내 것 같지 않다. “‘첫’의 품사는 관형사가 아니라 감탄사여야 한다”는 문장은 이미 누군가가 쓴 문장 같다. 얼마 전에 나는 “마감 때면 무슨 일이든 척척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 일이 마감만 아니라면 말이다”라는 문장을 썼지만 아무래도 어디선가 본 것만 같다.
나는 언제나 표절할 수 있다. 나는 언제나 표절의 위험 속에서 글을 쓴다. 적어도 내게 있어서 글을 쓴다는 것은 곧 표절할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과 같다. 나는 많은 문장을 읽었고 기억은 불확실하고 그것들의 출처를 따로 기록해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누군가 내 글의 일부 혹은 전부를 표절이라고 한다면 나는 순순히 시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각오로 독자가 보내온 메일을 열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 한 신문사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잠깐 뵈었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제 집사람이 선생 글의 애독자라고 하면서 인사 나누었던. 얼마 전에 우연히 ‘여보, 나 맘에 안 들지?’라는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글은 저희 집 사정을 그대로 표절하셨더군요. 특히 대화 부분은 저희 부부가 지난봄 공원에서 나눈 대화를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베껴 썼던데요. 어쩌렵니까? 저녁 한 번 사시면 없던 일로 해드리겠습니다.” ●
김상득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기획부에 근무하며, 일상의 소소한 웃음과 느낌이 있는 글을 쓰고 싶어한다.『아내를 탐하다』『슈슈』를 썼다.


![[오늘의 운세] 6월 2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