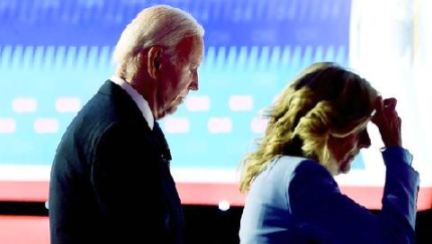극예술연구회는 처음에 극영동지회로부터 출발하였다.
홍해성·윤백남·서항석·유치진·이헌구등이 중심이 되어 극영동지회를조직하고 1931년 6월 동아일보 누상에서 연극·영화전람회를개최하였다.
연극·영화의 참고자료로서 무대사진·가면·인형·영화 스틸등 4천여점을 전시하여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는데, 특히 지식인·연극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이렇게 많은 참고자료가 나온것은 일본의 신극단체인 축지소극장에서 오랫동안 연극배우로 활약하던 홍해성이 모아두었던 것을 출품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회로 동지회 동인들은 유럽의 자유극장운동, 미국의 소극장운동, 일본의 축지소극장운동과 같은 신극운동을 우리도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일반의 공감을 얻었다.
이 전람회가 끝난 뒤 김진섭·유치진·이헌구·서항석·윤백남·이하윤·장기제·정인섭·조희순·최정자·함대훈·홍해성등 12명이 발기인이 되어 극예술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윤백남은 이름만 걸었지 회합에 출석한 일이 없고 10년 연장자인 홍해성을 좌장으로 앉히고 앞서 일본에서 조직된 「외국문학연구회」 사람들이 주체가 되었었다.
세상에서 해외문학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단체였던 것이다.
이들은 창립 취지에서 조선에 진정한 극문하를 수립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했고 사업내용으로는 관중, 특히 학생층의 교도, 배우의 양성, 기성극계의 정화, 그리고 신극수립을 위한 일체의사업을 기획한다고 하였다.
11월에는 극예술연구회 전속 극단으로 「실험무대」를 조직하고 연구생을 모집하였다.
이렇게 해서 1932년 5월에는 「실험무대」의 제1회 공연을 조선극장에서 가졌다.
러시아의 「「사길리」 원작인 『검찰관』 (함대훈역) 5막을 홍해성의 연출로 상연하였는데, 이 공연의 특색은 「실험무대」 에서 양성한 연구생 이외에 「극연」 의 동인중에서 이헌구·함대훈·서항석·유치진·이하윤·김진섭·조희정·최정자등 8명이 대거 출연한 점이었다.
이것은 일찌기 토월회공연때 박승희를 비롯한 동인들이 대거 출연한 것과 같이 관중에게 큰 호감을 주었다.
『검찰관』은 홍해성이 축지소극장에 있을 때 그곳에서 상연했던 것으로 홍해성은 그때 그것을 그대로 본뜬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연구적인 아마추어들이 첫번째 시연에서 이만한 효과를 나타낸 것은 극단의경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었다.
어떤 비평가는 토월회 제2회 공연이후 10년만에 보는 최대의 수확이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
토월회와 다른 것은 토월회가 일본 대정기의 신극을 번안하고 이식한것에 비해「극연」은 축지소극장의 신극운동을 본뜬 것이었다.
「극연」 의 동인들은 그 대부분이1924년에 개장한 축지소극장의 신극을 열심히 보아온 동경유학생들이고, 특히 「극연」 의 초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출을 담당해온 홍해성은 1924년의 축지소극장 제2회 공연 『이리떼』이래로 계속 무대에 서서 소산내훈의 연출과 여러 배우들의 연기를 배워 1930년 귀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극연」은 축지소극장의 신극운동을 본뜬 것으로부터 시발해 점차로 우리 자신의 신극운동을 모색해갔다고 말할수 있다.
이제 「극연」 의 신극운동을 개관한다면 대체로 3기로 나눌수 있는데, 제1기는 홍해성이 연출을 담당한 1932년 5월부터1934년 12월까지로 볼수 있고, 제2기는 홍해성이 동양극장전속 연출자가 되어 「극연」 을 떠난 뒤 유치진이 연출을 담당해온 1935년부터 1938년까지로 볼수 있다.
제3기는 1938년 시국이 급박함에 따라「극연좌」 라고 이름을 고치고 1939년 5월 해산될 때까지로 볼수 있다.


![50마리 구조해 절반 죽었다…'개농장 급습' 라이브 방송 실상 [두 얼굴의 동물구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e5e5af3-4691-482d-a87f-a730a3b763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