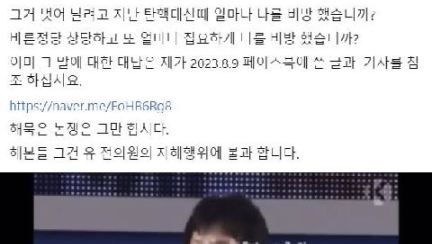고등학교를 중도에서 자퇴하고 한동안 나는 막막해져 있었다. 73년의 가을이었다. 밤마다 가출을 꿈꾸었고 새벽이면 차디찬 이슬을 밟고 텅 빈방으로 돌아오곤 했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맨숭맨숭할수가 없었다. 살아있다는 게 싱겁기 그지없었고, 그 그지없는 싱거움이 견디기 어려웠었다. 종교주변과 문학-.특히 시-의 변방에서 늘 서성거리며 지냈었다 .글도 아닌 글을 만들기 위해 하얗게 시간을 벗겨보기도 했었고. 그러한 시간 벗김의 결과가 너무도 하찮은 것이어서 부끄러웠었다. 부끄러움의 끝에는 언제나 시퍼런 칼 하나 놓여 있었다. 시퍼런 칼날에 의해 구원받으리라고 꿈꾸기도 했었다. 81년 한 해동안은 사는게 너무나 막막했었다. 돌, 바람, 먼지, 안개, 모래 따위만 떠도는 춘천의 석사동에서 나는 혼자였었다. 시는 한줄도 써지지 않고있었다. 나는 산문을 한번 써보기로 작정을 했다. 시가 안 써지니까 문장력을 길러보자는 생각이었다. 제목도 없고, 주제도 없었고, 구성도 없었다. 막말로 생각(?)나는 대로 써 내려갔다. 다 써놓고 보니 조금 그럴듯했다. 마침 계절은 신춘문예 철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는 그 글에다 그럴듯한 제목을 붙인 다음 마감 전날 신문사로 우송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신춘문예에 응모했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겨울방학을 맞아 나는 강원도 사북에 가서 C형과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다. 3일 밤낮을 C형으로부터 구박도 받고, 위로도 받으며 지내다가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때는 공연히 눈물이 쏟아지고 한없이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었다. 오랜만에, 탕아가 되어 집에 돌아와 보니 뜻밖에 당선통지서가 날아와 있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신문사로 전화를 했었다. 『소설 당선된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나는 물었었다. 수화기 저쪽으로부터 또박또박한 음성으로 내 이름 석자가 흘러나왔을 때, 꿈만같이 느껴졌었다. 나는 방바닥에 엎드려서 당선소감을 쓰기 시작했었다. 당선소감을 쓸 때의 그 설렘.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기쁨이었고 슬픔이었다. 그 때 나는 혼자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