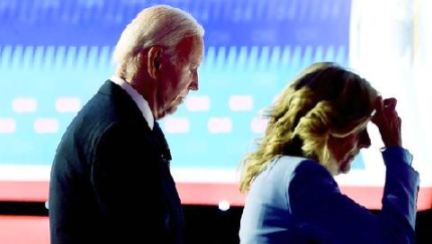이훈범
이훈범논설위원
간신(奸臣)의 사회적 함의는 문자 그대로 간사함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사전은 푼다. 삐뚠 마음 나쁜 꾀의 품새가 따로 있지 않을진대 드라마나 영화 속 간신들은 정말 간신처럼 생겼다. 사악한 눈빛과 음흉한 미소, 비열한 몸짓으로 간신의 모습을 정형화한다.
그 때문에 늘 속는다. 현실에 분명 간신이 존재하거늘 우리 눈이 알아채지 못한단 말이다. 그렇다. 간신은 간신처럼 생기지 않았다. 국가대표 간신 이완용도 간신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술과 여자를 멀리하고 시문과 서예를 즐기는 점잖은 조선 선비 모습이었다. 중국 최고의 간신 진회도 그렇다. 악비의 묘 앞에 꿇고 있는 동상조차 20년 재상의 유능한 관리 얼굴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여러 모습의 신하들이 있다. “보기 드물게 사심 없다”는 비서실장이 있고, “수사 덕에 비리 의혹을 떨쳤다”는 ‘문고리’ 비서관들이 있다. “실세는커녕 관계도 없다”는 옛 비서가 있는가 하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렸다”는 비서관과 행정관도 있다. 거기 더해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던진 비서관도 있으며 여당 대표에게 이를 갈다 잘린 행정관도 있다.
이들 중 누가 간신인지 정하는 건 섣부르다. 간신처럼 생긴 사람도 없거니와 구중궁궐 속사정을 낱낱이 알 수도 없는 까닭이다. 주군도 속는 게 권력의 속성이니 대통령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는 없겠다. 다툼이 있으니 잘못이 있을 테고 길든 짧든 역사가 진실을 말해줄 터다.
그래도 궁금하니 나름 잣대를 대볼 순 있겠다. 명쾌한 기준만 있다면 말이다. 순자(荀子)가 길을 일러준다.
순자는 신하의 길(臣道)을 다섯 가지로 나눈다. 명령을 따르고 군주를 이롭게 하는 걸 순(順)이라 한다. 현군 아래 현신 있는 이상적인 경우다. 올바른 지시를 잘 따르니 순조롭지 않을 리 없다. 명령을 거스르며 군주를 이롭게 하는 게 충(忠)이다. 무조건 따른다고 충성이 아니란 얘기다. 명령을 따르는데 군주를 이롭지 못하게 하면 첨(諂)이다. 아첨의 적극적 해석이다. 군주의 잘못에 눈감는 것도 아첨인 거다. 명령을 거슬러 군주를 이롭지 못하게 하면 그건 찬(簒)이다. 이건 찬탈, 즉 반역이니 설명이 필요 없다.
누가 봐도 대통령이 이롭게 된 상황이 아니니 첫째와 둘째는 아니다. 그렇다면 첨 아니면 찬이다. 따로 구분할 것도 없이 순자 기준으론 다 간신들이란 말이다.
하긴 권력자한테 바른 소리 하는 게 어디 쉽겠나. 작은 기업에서조차 사장 앞에서 “그게 아니고요”란 말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통치권자인 대통령 앞에서야…. 고양이 목 방울은커녕 제 목이 걱정인 거다. 그래서 간신인 줄도 모르고 간신이 되는 거다.
간신들이 있다면 모두 군주 책임인 게 그 때문이다. 직언을 들을 준비가 안 된 군주 곁에 꼬이는 게 간신 아닌가. 순자는 “군주의 치욕을 막고 나라의 이익이 된다면 능히 군주의 명을 거역하고 필요하다면 군주의 권한까지 대신 행사하는 게 보필”이라고까지 말한다. 그걸 가능케 하는 ‘군주의 길(君道)’이 있다. “밝은 군주는 함께하길 좋아하고 어두운 군주는 혼자 하길 좋아하며, 밝은 군주는 이런 신하를 포상하고 어두운 군주는 처벌한다.”
권력자가 일부러 쓴소리 통로를 터놔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못한 어두운 군주 앞에서 신하들은 첨 아니면 찬, 아니면 다섯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군주의 명예나 치욕, 그리고 나라의 흥망엔 관심 없이 구차하게 영합해서 녹봉이나 받는 것을 국적(國賊)이라 한다.”
이런 간신 아닌 간신들로 넘쳐날 때 군주의 치욕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의 잠자리가 편안할 수 없는 것이다. 순자 말이 그거다. “이것은 신하 된 자를 논한 것으로 나라의 길하고 흉함과 군주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알게 하는 최상의 것이다.”
이훈범 논설위원


![50마리 구조해 절반 죽었다…'개농장 급습' 라이브 방송 실상 [두 얼굴의 동물구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e5e5af3-4691-482d-a87f-a730a3b763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